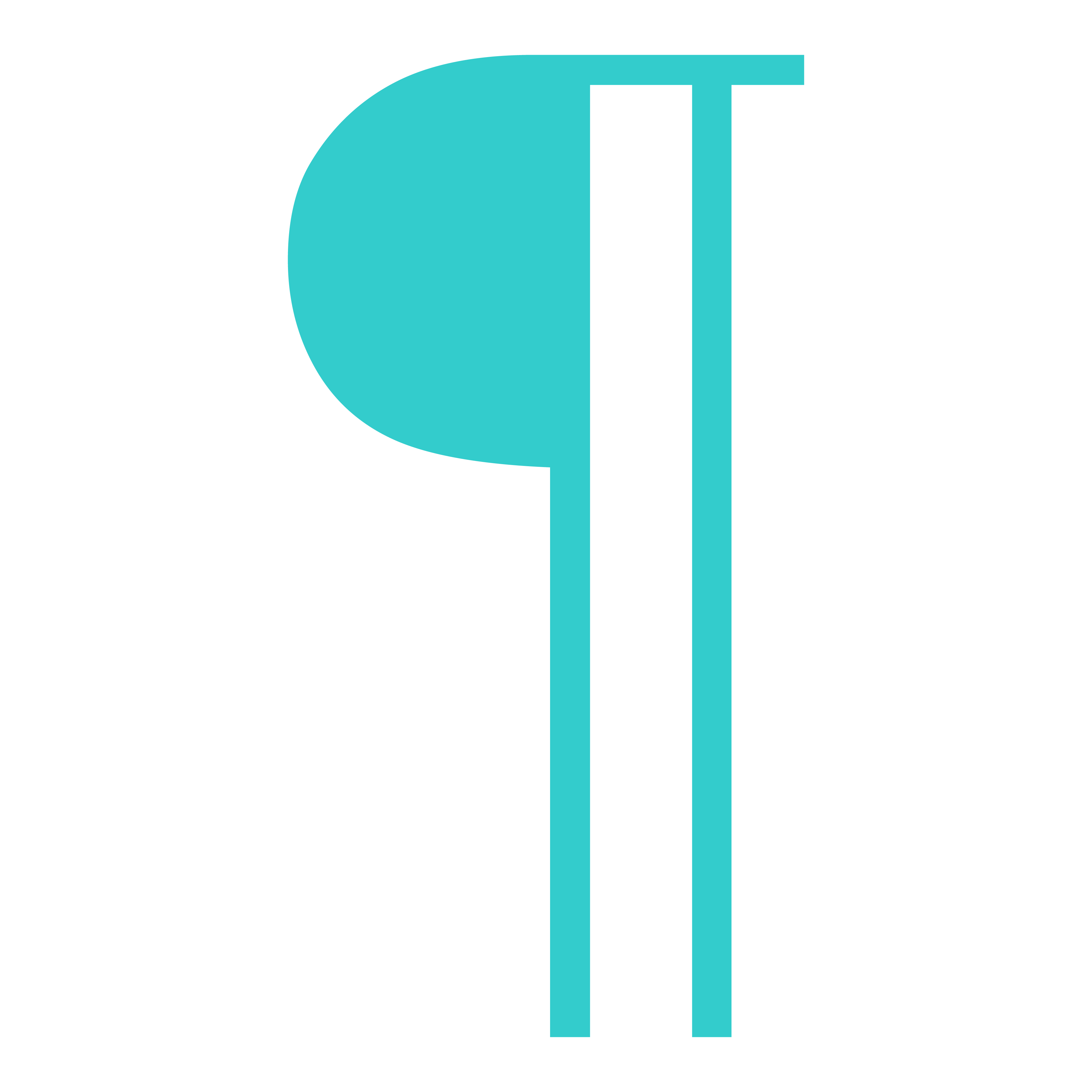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어떤 이는 숫제 고독을 천성처럼 타고나서 남보다 신비스럽게 돋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는 못할망정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닌다거나 또는 가끔 알사탕을 꺼내 핥듯이 기호품의 일종처럼 음미하기도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편리한 재간이 없었다."
-p.18
"명동은 밝고 흥청댔다. 가게마다 쇼윈도가 있었다.
나는 날씬한 마네킹이 걸친 푹신한 외투를 실컷 선망하고 완구점 앞에서 태엽만 틀어주면 징도 치고 위스키도 따라 마시는 유쾌한 침팬지를 보고 마음껏 소리내어 키득대기도 했다.
드디어 나는 다시 어둠 속에 섰다. 한쪽에 부연 하늘을 이고 검게 치솟은 성당 건물이 보였다.
무엇이든 기구하고픈 충동으로 나는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p.29
"아무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만두를 못 먹었을 때만큼 그렇게 크게 비참해져서는 안된다고 다짐하며 양장점과 양품점의 거리를 질주하고, 다시 음식점의 거리로 접어들었다.
그 동안 나는 그를 다시 본의 아니게 허탕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궁리를 거듭했다. 어떡하면 그를 향해 나를 열 수 있을까하고. 그가 나에게 멋있게 보이던 순간들을 모아봤다. 그 푸른 면도자국의 남자다운 완강한 턱의 회상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의 턱에 이마를 대면 훈풍에 생경한 꽃봉오리가 열리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의 턱에 이마를 대고 그의 심장의 고동을 듣는 일은 내가 언젠가 열망했던 일이었잖은가. 그렇게 우선 해줘야지. 그 다음 생각은 말기로 하자. 그 다음은 태수가 알아서 할 테니까. 드디어 피부비뇨기과의 간판 앞에 섰다. 태수의 방은 불이 꺼져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유리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p.112
"김씨와 돈씨도 착하디착하다."
-p.113
"그들이 오늘은 너무 착하다."
-p.116
"그녀가 자꾸 까다로운 소리를 할 것 같아 성가셨다. 나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부터 놓여나 피곤한 몸을 마음껏 흐느적대며 내 일을 생각하고, 별과 상가의 불빛을 보고, 그 다음은 어둠과 추위에 나를 팽개쳐야 하고, 꼭 나 혼자만 해야 할 일들로 난 꽤나 바쁜 몸이었다."
-p.124
"나는 또 물구나무가 서고 싶어졌다. 악을 쓰며 물구나무를 서서 온 매장을 헤매며 여러 사람의, 자기가 살아갈 길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여러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소리쳐 묻고 싶었다.
오늘 저녁 침팬지 앞에 가는 것이 옳으냐, 안 가는 것이 옳으냐하고. 나는 그것조차도 모른다고. 그러나 나는 물구나무도 못 서고 악도 못 쓴 채 멍하니 갈까 말까만을 되풀이했다."
-p.149
"아아, 전쟁은 분명 미친 것들이 창안해 낸 미친 짓 중에서도 으뜸가는 미친 짓이다."
-p.150
"햇볕 쏟아지는 푸른 잔디, 착한 아내, 꼭 천사 같은 세 딸, 그런 곳에서 멀리 떨어져 그는 지금 황량한 이국의 거리에서 찬 눈을 맞고 서 있을 게다.
"씨이발"
김씨가 기지개를 크게 켰다.
"제에기랄"
돈씨가 붓을 던지고 담배를 물더니 라이터를 덜그럭댔다."
-p.151
"그리고 문득 여벌로 또 하나의 태수가 있었으면 했다"
-p.153
"의치를 끼우게 해야지. 강제로라도, 애원을 해서라도.
그러고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곧이어 살고 싶다고 고쳤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두 상반된 바람이 똑같이 치열해서 어느쪽으로도 나를 처리할 수 없다."
-p.166
"흠잡을 나위 없는 완벽한 정돈, 그러나 거긴 통 생활의 냄새가 없었다. 한기가 돌았다. 그것들은 아버지와 오빠들의 유품인 동시에 어머니의 유품인 것도 같았다."
-p.167
"글쎄 말이야. 그놈이 태엽만 틀면 술을 마시는 게 처음엔 신기하더니만 점점 시들하고 역겨워지기까지 하더군. 그놈도 자신을 역겨워하고 있는 눈치였어. 그래서 그런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게야.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태엽만 틀면 그 시시한 율동을 안할 수 없고... 한없이 권태로운 반복, 우리하고 같잖아. 경아는 달러 냄새만 맡으면 그 슬픈 <브로큰 잉글리시>를 지껄이고 나는 달러 냄새에 그 똑같은 잡종의 쌍판을 그리고 또 그리고"
-p.172
"그것은 아마 한겨울 밤의 환각이었나 보다.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가 꾼 것과 같은 꿈, 굶주렸던 그녀가 칠면조 고기와 따뜻한 난로를 환각했듯이 오랜 외로움 끝에 인자한 할머니를 환각했듯이 나도 내가 굶주렸던 것을 환각한 것뿐이다.
나에게 분명 있었던 일은 다만 소꿉장난감을 선물받았다는 일뿐인 것이다.
나는 그 장난감을 얼어붙은 땅으로 힘껏 동댕이쳤다."
-p.174
"나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부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이 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화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톨도톨한 질감을 주는 게 이채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부연 혼돈 속에 고목이 괴물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p.195
"어쩌면 그녀는 온통 가짜투성이고, 어머니고 갈보고 수전노고 다 가짜고 가짜를 빼면 그녀는 마치 빈 동굴 같을 게라고, 완전한 허인 그녀, 나의 어머니 같은 허만 남겨진 그녀를 상상하고 나는 비로소 복수의 쾌감 같은 걸 느꼈다."
-p.206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지러진 지붕을 대낮에도 볼 수 있었으면 싶었다. 똑바로 용마루를 꿰뚫은 구멍을 보고, 부서진 기왓장을 보고 싶었다. 미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볼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p.207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보면 살아 있다는 것이 송구스러워 절로 몸이 오그라들고 고작 어머니로부터 피한다는 게 은행나무 밑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은행나무 밑에서 하루하루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키우고 있었다.
어머니를, 지금의 내가 비참한 것만큼의 다만 얼마라도 비참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p.231
"그의 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대문을 흔들지 않고 창문을 두드렸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나직이 한 두 번 불렀을 뿐인데 방에서 인기척이 나고 황급히 대문이 열렸다."
-p.236
"이치? 사막에서 목마른 자가 신기루나 환각으로 오아시스를 보는 데도 이치가 있을까?"
"오, 어떡하면 자네가 알아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미칠 듯이 암담한 몇 년을, 그 회색빛 절망을, 그 숱한 굴욕을, 가정적으로가 아닌 예술가로서 말일세. 나는 곧 질식할 것 같았네. 이 절망적인 회색빛 생활에서 문득 경아라는 풍성한 색채의 신기루에 황홀하게 정신을 팔았대서 나는 과연 파렴치한 치한일까? 이 신기루에 바친 소년 같은 동경이 그렇게도 부도덕한 것일까?"
-p.272-273
"그는 훌쩍 가버렸다. 우리는 둘만이 남겨졌다. 고아끼리인 셈인가. 고아들은 남을 사귀기에 서툴다."
-p.273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로된 것이었고 한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막음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p.281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봄에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리라.
나는 홀연히 옥희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p.285
Lily Allen - Somewhere only we know
박수근, 나무와 두 여인(1962)
박수근, 나무와 두 여인(1964)
'세 계절 읽기 모임 > 글대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회)모니카 마론, <슬픈 짐승> / 최은순 (2) | 2015.12.01 |
|---|---|
| (4회) 모니카 마론, <슬픈 짐승>(김미선 옮김) / 릴 (0) | 2015.11.28 |
| (4회) 모니카 마론, <슬픈 짐승> / YKS (0) | 2015.11.22 |
| (3회) 박완서, 나목 / 히요 (0) | 2015.11.14 |
| (3회) 박완서, <나목>(1970/2012) (0) | 201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