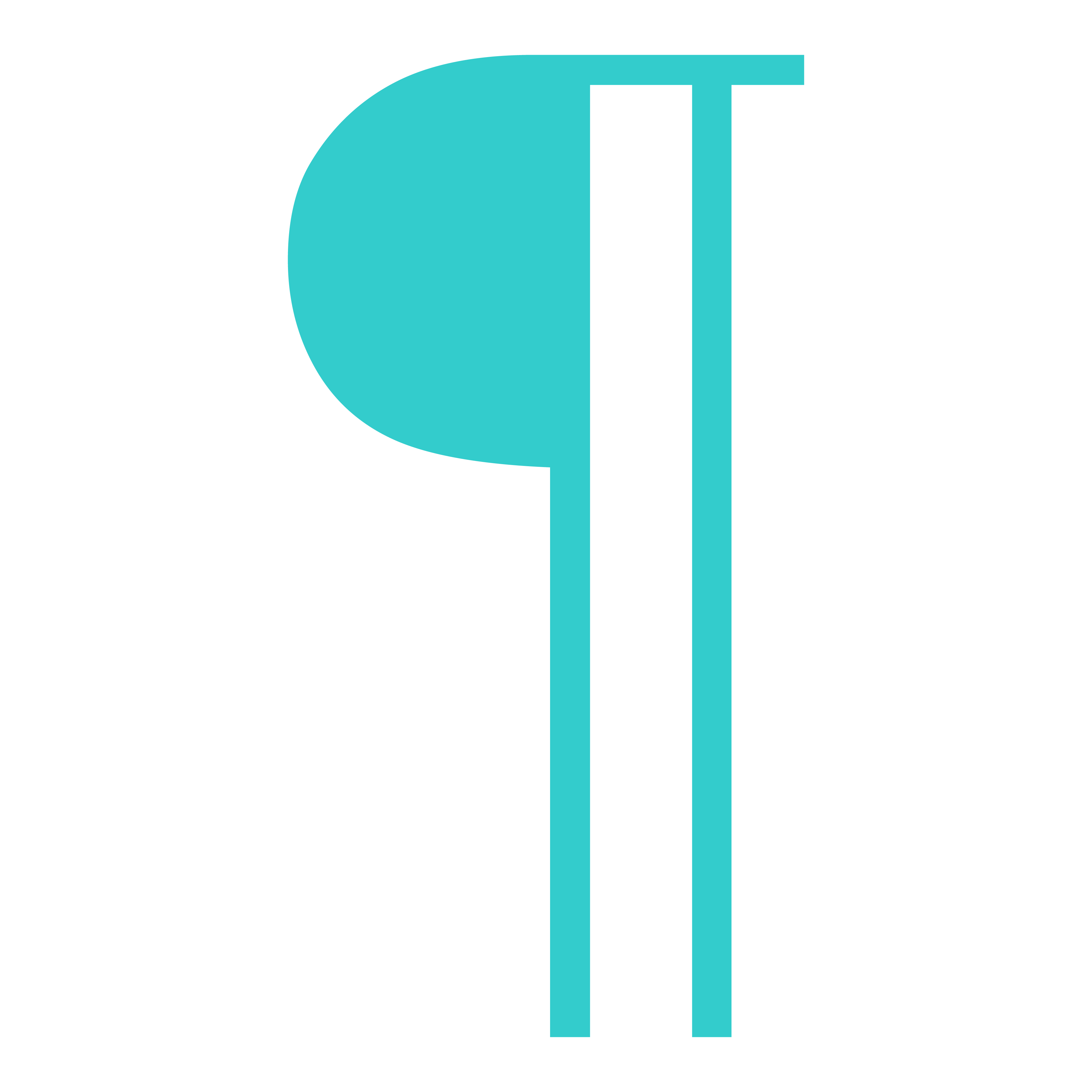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여자와 남자가 이루는 풍경, 거기엔 적어도 춥지 않은 무엇이 있었다. 저들도 춥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추운 김에 아쉬운 대로 옆에 있는 옥희도 씨라도 좋아해볼까 하는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느라 별로 무섭다는 생각도 없이 어두운 길목을 지났다."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2, 35~36쪽.
_나루세 미키오成瀬巳喜男, <부운浮雲>, 1955
패전 후 폐허로 변해버린 동경 거리를 잠깐 함께 걷고 있는 도미오카와 유키코의 뒷모습.
"그러고 보니 오늘 밤의 소란은 꼭 전쟁의 소음 같다. 전쟁의 노도가 어서 밀려왔으면, 그래서 오늘로부터 내일을 끊어놓고 불쌍한 사람을 잔뜩 만들고 무분별한 유린이 골고루 횡행하라. 광폭함 쾌감으로 나는 마녀처럼 웃으면서도 그 미친 전쟁이 당장 덜미를 잡아올 듯한 공포로 몸을 떨었다. 다시는 다시는 그 눈먼 악마를 안 만날 수만 있다면.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이 두 가지 절실한 소망은 항상 내 속에 공존하고, 가끔 회오리바람이 되어 나를 흔들었다. 미구에 나는 동강나버리고 말 것이다. 나는 자신이 동강 날 듯한 고통을 실제로 육신의 곳곳에서 느꼈다. 나는 아픔을 잊으려는 듯이 안방을 마구 서성대며 이 아픔의 까닭이 비롯된 시절로 자꾸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다."
―124쪽.
"달아나버린 한쪽 지붕과, 용마루에 뚫린 나락 같은 구멍과 조각난 기왓장들을 밝은 빛 속에서 선명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공자님의 나체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모독 같았다.
반드시 어둠 속에서 부연 하늘을 이고 섰어야 하는 우리 집. 그 앞에서 내가 누리는 일종의 외경과도 통하는 공포. 나의 하루의 초점이 그 순간에 있고 나는 그것을 추호도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139쪽.
"아무리 작아도 내가 오늘 입 밖에 낸 최초의 우리말, 그러나 그것은 우리말이었을 뿐 결코 내 말은 아니었다. 나의 느낌, 내 의사가 담긴 내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 같았다. 말이 아니라 외침에라도 몸짓에라도 정말 나를 담고 싶었다.
(중략)
미군 상대의 가게에서 쇼리가 웬 흑인을 붙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는 멈춰 서서 그의 슬픈 영어를 들었다.
"할로, 프리이스 캄 캄 룩크 룩크. 위 해브 매니 매니 베리 나이스 프레센트."
(중략)
"씨이발 개애새끼."
통쾌한 우리말이다. 금세 속이 후련해진 나는 꼬마에게 크게 미소 지어 보이며 물었다.
"오늘 많이 팔았니? 꼬마야."
이것이 내가 오늘 한 최초의 내 의사가 담긴 우리말인 것 같았다."
―163~164쪽.
"눈 때문에 어둠도 부옇고 어둠 때문에 눈도 부옇고, 고래르 ㄹ저히니 하늘도 자국하니 별빛을 가로막고 암회색으로 막혀 있었다. 나는 명도만 다른 여러 종류의 회색빛에 갇혀서 허우적대듯 걸었다. 아무리 허우적대도 벗어날 길 없는 첩첩한 회색, 그 속에서도 나는 환상과도 같은, 회상과도 같은 황홀한 빛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완구점 앞에서의 옥희도 씨와의 만남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회상이라기에는 너무도 휘황해서 마치 환상 같으면서도 환상이라기에는 너무도 생동하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곧 태수와 그의 가족들과 있었던 일은 잊었다. 그것은 그냥 부연 회색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209쪽.
"의치를 끼우게 해야지. 강제로라도, 애원을 해서라도.
그러고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곧이어 살고 싶다로 고쳤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두 상반된 바람이 똑같이 치열해서 어느 쪽으로도 나를 처리할 수 없다.
어머니는 그림자처럼 나와서 문을 열었다. (중략) 아무것도 생각 않는 상태, 완전한 허虛, 이런 걸 나는 짐작도 할 수 없다.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완전히 허일 수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218쪽.
"글쎄 말이야. 그놈이 태엽만 틀면 술을 마시는 게 처음엔 신기하더니만 점점 시들하고 역겨워지기까지 하더군. 그놈도 자신을 역겨워하고 있는 눈치였어. 그래서 그런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게야.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태엽만 틀면 그 시시한 율동을 안 할 수 없고……. 한없이 권태로운 반복, 우리하고 같잖아. 경아는 달러 냄새만 맡으면 그 슬픈 '브로큰 잉글리시'를 지껄이고 나는 달러 냄새에 그 똑같은 잡종의 쌍판을 그리고 또 그리고."
―226~227쪽.
"여러 가족들은 한결같은 고른 숨을 쉬고 나는 몸이 와전히 녹고 또 피곤했다. 나도 어느 틈에 고른 숨을 쉬다간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비벼 떴다가 다시 고른 숨결에 이끌렸다."
―314쪽.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봄에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리라.
나는 홀연히 옥희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376쪽.
'세 계절 읽기 모임 > 글대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회)모니카 마론, <슬픈 짐승> / 최은순 (2) | 2015.12.01 |
|---|---|
| (4회) 모니카 마론, <슬픈 짐승>(김미선 옮김) / 릴 (0) | 2015.11.28 |
| (4회) 모니카 마론, <슬픈 짐승> / YKS (0) | 2015.11.22 |
| (3회) 박완서, 나목 / 히요 (0) | 2015.11.14 |
| (3회) 박완서, <나목> / YKS (2) | 2015.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