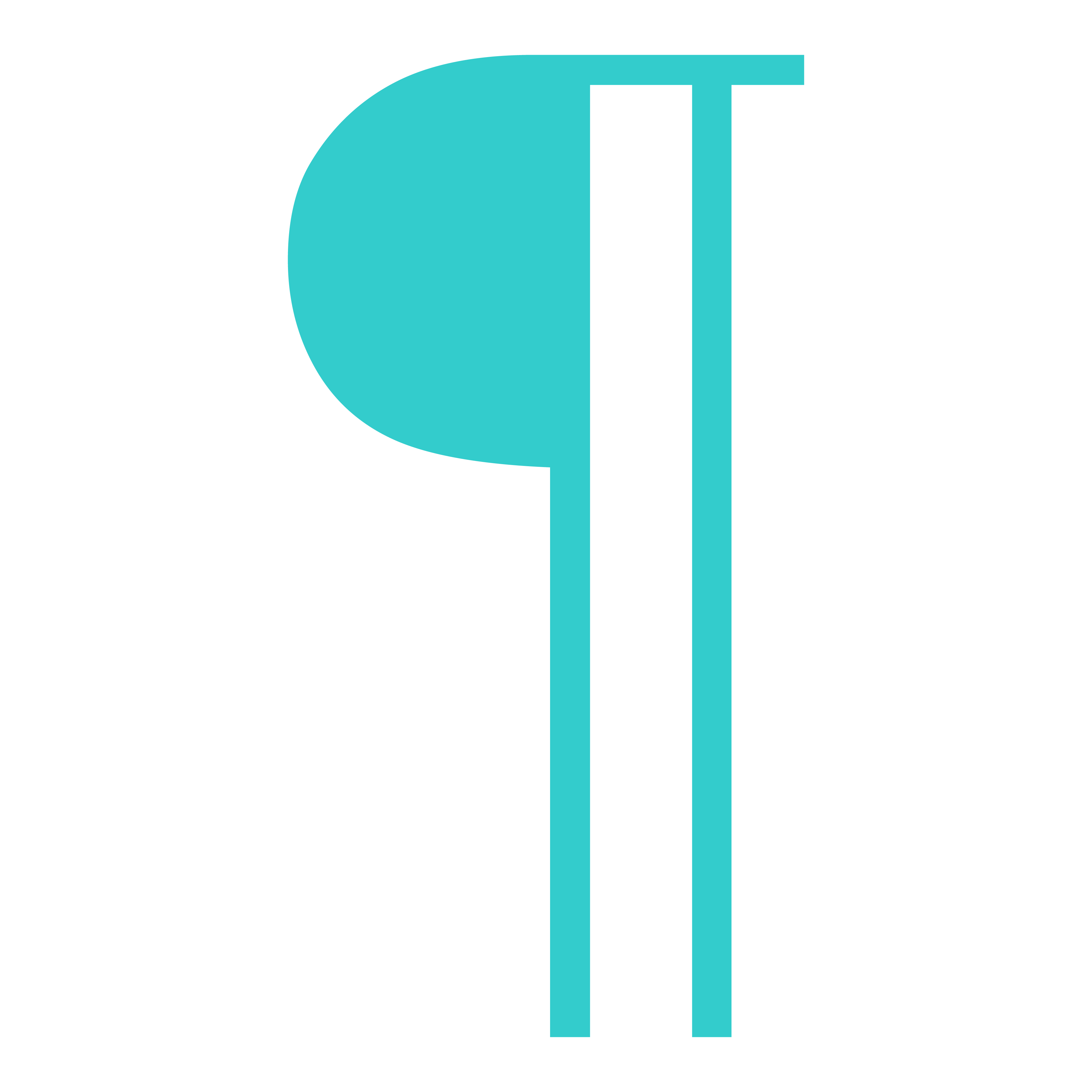2015. 12. 14
비리고 흉물스럽게만 느껴지던 복어의 비늘을 어느 사이에 마다하지 않고 먹게 되었기 때문일까. 나는 몇달만에 먹었던 복지리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 말고는 오른쪽 볼에서부터 왼쪽 입술 아래까지 퍼진 두드러기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생전에 겪어보지 못한 두드러기가 며칠이 지나도 차도가 없다.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니 병원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두드러기를 거울에 비춰볼 때마다 상태가 호전될 거 같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만이 선명해진다. 10일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감기를 앓았고 지금은 거의 떨친 상황인데, 별안간의 두드러기 때문에 또 내 몸 앞에서 주저 앉게 된다. 오돌토돌한 표면을 이래저래 만져보고 거울에 비춰보면서 분명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무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 굳게 닫힌 성문 앞에 내내 기다리다 감금된 느낌이다.
두드러기는 분명 어떤 증상이고 징후이겠지만 외적인 흉물스러움에 먼저 압도되는 탓에 차분하게 들여다보기 전에 염려라는 정서에 붙들리게 된다. 이 염려는 단순히 몸을 걱정하는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닌데, 이어 말하면 두드러기라는 ‘문제’의 원인이 필시 외부적인 이유로부터 발생했으며 그것도 아주 나쁜 것이 몸 안으로 침투했다는 부정적인 규정을 서둘러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염려’가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아닌 잘못을 찾아내고 나쁨을 알아차리는 부정적인 태도와 이어져 있다는 것. 나조차 모르고 있던 내 염려의 오래된 습벽 속에 가려져온 어떤 모습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를 통해 어렴풋이 알게 된 느낌이다. 나는 얼굴에 퍼져 있는 두드러기를 차분히 들여다본다. 이건 음식 탓이 아니다.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같은 게 아니다. 스트레스 때문도 아니다. 가려움이나 설사를 동반하지 않았고 그간 감기가 호전되었으며 몸도 가볍다. 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둘러 부정적인 증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바라보며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그건 염려 앞에서 ‘내 탓이 아냐’라고 성급하게 외치며 외부에 그 문제를 전가하려는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 염려가 과도한 자기방어와 외부를 향한 공격으로 점철되어 왔던 건 아닐까. ‘자아’의 벽을 쌓아두고 바깥을 향해 긴 막대기를 내밀어 곁에 있는 이들을 밀어냈던 것은 아닐까. 나의 ‘염려’라는 게 나 홀로 쌓아올린 자아의 성벽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바깥을 향해 손을 뻗고 또 내밀어 무언가를 건네기 위한 애씀이 염려라는 성벽에 걸쳐 있어서 아무리 배려하고 사려깊음의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공격’으로 전달되었던 것은 아닐까. 거듭되는 질문을 쥐고 두드러기의 표면을 두드려본다. 두드러기가 더 번지는 것 같더니 그 주변에 허연 각질을 일으키고 있다. 육안으로 더욱 분명해진 두드러기에 놀라지 말자. 가려움도 없고 더 번지지도 않았다. 그래, 저 분명한 각질은 소강 상태의 표지인지도 모른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2주간 한잔의 커피도 마시지 않았고 내내 녹차만 마셔왔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명현(瞑眩) 현상이라고 믿고 싶은 건 아니다. 다만 두드러기가 그저 하나의 소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여보고 싶은 것이다. 무언가가 오고 있다. 이미 도착했는지도 모른다. 두드러기가 그것을 알리고 있다.
릴riil
갖은 불화 속에서 언제라도 '잘 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람을 품고 크고 작은 모임에 관여하고 또 간여하고 있다. 읽고 쓰는 것과 먹고 자는 것을 '일'이 아닌 '힘'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임을 증명하고 알리는 데 애쓰고 있다
'생활-글-쓰기 > 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물처럼(1) / 릴 (0) | 2016.04.08 |
|---|---|
|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다―이별례(8) / 릴 (2) | 2016.01.26 |
| 걸레의 자리 / 릴 (2) | 2016.01.16 |
| 10대라는 비평-쓰지 못한 글(1) / 릴 (3) | 2015.12.20 |
| 절판도서 / 릴 (0) | 201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