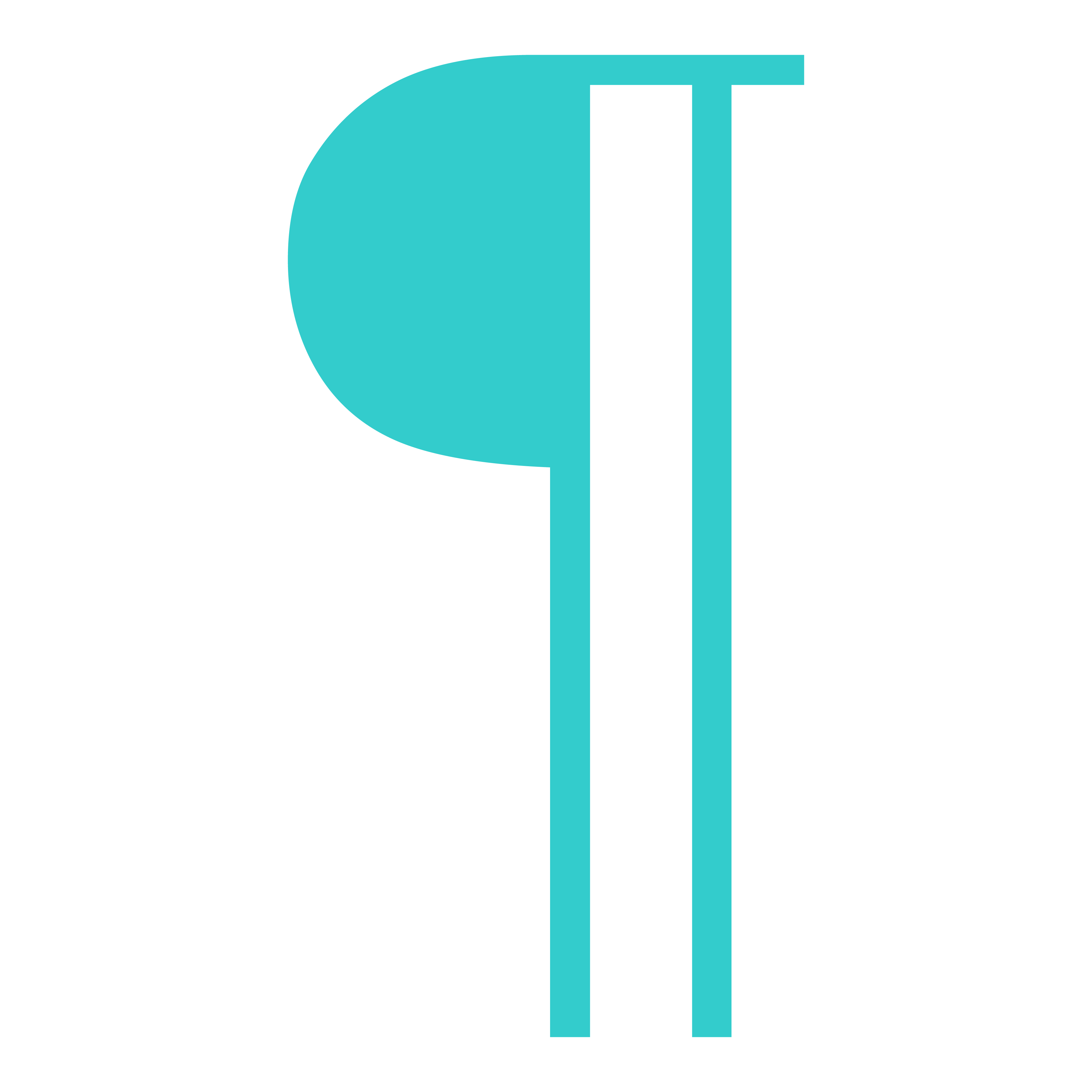룸메이트 때문에 불을 켜지 못하여 손으로 쓴 것은 내일 가져가도록 하고
우선은 여기로 옮겨 적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만나고 싶었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 미루고 미루다 나온 자리이기도 하고 미안함과 고마움의 감정으로 나온 자리이기도 했다. 처음엔 셋이었지만 어느새 넷이 되었다. 지나가는 같은 과 선배를 알아본 동생이 그 선배를 불러세웠고 어느새 같이 술을 마시게 됐다.
술을 마시던 중 셋은 나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세모회사 누구누구누구. 사회 생활에 있어서 '그'와 '그녀'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손바닥만한 종이. 나는 받았지만 아직 줄만한 것은 없었다. 명함 때문이었는 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내 고민을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게 됐다. 어쩌면 명함 때문이라기 보다 '그' 선배때문일 지도 모른다.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궁금했다. 2주 전 모임 이후 생활의 극단이라는 말이 흩어지지 않고 남아서 맴도는 이유와도 같았다. 생활한다는 것 그 무거움에 대해서 실감하는 요즘, 누구에게라도 '다들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라고 묻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 충동은 입 밖으로 내뱉어 질 때도, 아니면 입 안에서 잘근잘근 씹혀버릴 때도 있다. 혹은 침과 함께 꿀꺽 삼켜져 위 속으로 내려가 버릴 때도 많다. 말이 생겨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 배출되기 위해서라면 내 어금이 사이에서 씹혀버린,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가 버린 말들은 어디로 배출되는 걸까. 그렇게 배출되지 못한 말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금 내 입을 떼지 못하게 막는 것만 같다.
그러한 입막음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나다. 그 답답함은 어느새 익숙함이라는 것에 희석되어 더 이상 느끼지 못 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결코 말하지 않음이 편하지는 않다. 불편의 해소가 필요하다.
'생활-글-쓰기 > el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는 벽을 원한다./elly (1) | 2015.12.07 |
|---|---|
| 새로운 사람들과 밀린 말들 (3) | 2015.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