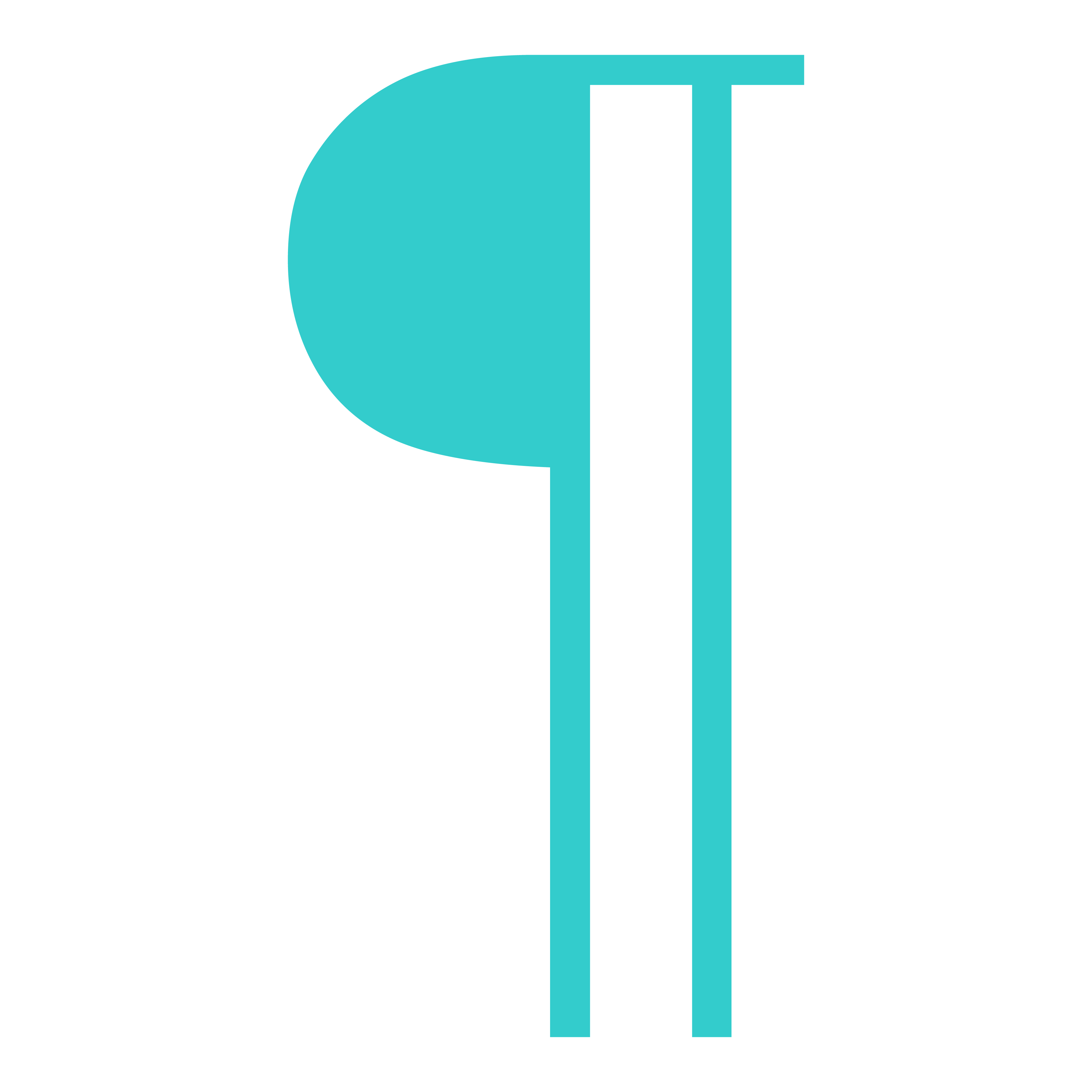빠꼼히 밖을 건너다봐요. 맞은 편 동일아파트에 불 켜진 집들의 수를 헤아려 봐요. 불 켜진 집이 몇 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실 한 면을 가득 채운 문은 불과 20센티미터 정도밖에 열려 있지 않아요. 유리문과 방충망 사이에는 여닫이 방범창이 있어요. 방범창엔 버젓이 두 개나 되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도 문을 활짝 열어젖히지는 못해요. 밤이거든요. 불을 켜는 일도 쉽지 않아요. 집안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불을 켜는 순간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이 와락,하고 달려들 것만 같아서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내려 올 때 다락방 앞에 사다리 대신 놓인 의자를 딛고 내려오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슬쩍 다리를 뻗으며 안경을 치켜 올리고 눈을 부릅떠 아래쪽을 내려다보아도 의자 위에 놓인 실내화를 제대로 꿰어 신는 일은 드물어요. 실내화를 어디다 벗어놓았는지, 찾는 것도 포기하고 맨발로 마룻바닥에 내려와요. 그리고 살금살금 걸어요. 새벽 두 시가 넘은 시간이고 작은 방과 화장실로 이어지는 부엌방은 아랫집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방이라고, 예전에 주인집 할아버지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다 들린다고. 그래서 화장실 물 내릴 때마다, 특히 오늘처럼 새벽시간에 화장실 물을 내릴 때면 변기에 물 내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뒷목덜미가 뜨끔해요.
밖을 내다 봐요. 그것도 빠꼼히 내다봐요. 쪼그려 앉아 자라목을 하고선 좁은 문틈으로 얼굴을 갖다 대고 눈알을 굴리며 여기저기를 봐요. 맞은 편 건너 동일아파트 어느 곳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어요. 시끄러운 싸이렌 소리가 지나가고 오토바이 배기통에서 내뿜는 소리도 요란하게 들려요. 그리고 조용.
실내 공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차가운 공기가 끼쳐 와요. 바람이 건드려 덜컹이는 문을 잠재우기 위해 무언가를 문틀 사이에 괴어 놓지 않아도 되는 밤이예요. 거실이고 방이고 화장실이고 간에 바람소리에 민감한 오래된 이층 주택인데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다는 게 새삼스럽게 이상해요. 평소에 문틀 사이에 끼어놓곤 하던 면장갑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도 이상해요. 좀처럼 깨어 있지 않는 시간이고 어지간해서는 깨어 있고 싶지 않은 이 시간에 이렇게 번연히 깨어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걸 보면 시끄럽게 덜컹이고 있는 건 내 속인가 봐요.
문틀 사이에 괴어놓곤 하던 면장갑을 자꾸만 삐거덕대고 부대끼는 내 마음들 사이에 괴어 놓는 심정으로, 담배를 피워 물어요. 두 대나 피워 버려요. 그런대도 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아요. 기다려라, 시간을 갖고 지켜봐라. 잠깐씩, 어렴풋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지인들에게서 듣곤 하는 말이에요.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 맞춰 사람들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이건 어제 들은 말이에요. 제대로 기다려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참 힘들고 지난한 시간이에요. 온전히 나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감각들이 무너지는 느낌도 들어요. 긴장을 풀라치면 어지 없이 몸이 휘청대는 통에 아찔해 질 때도 있어요. 문틀 곳곳에 끼워져 있는 얄팍하게 접은 종이와 면장갑들, 또 어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지 그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내가 참 지겨워요.
'생활-글-쓰기 > 은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회) 나의 중심 / 최은순 (0) | 2015.12.07 |
|---|---|
| 길에 누운 사람들 / 최은순 (4) | 2015.10.27 |
| 내 앞에 글쓰기 / 최은순 (5) | 2015.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