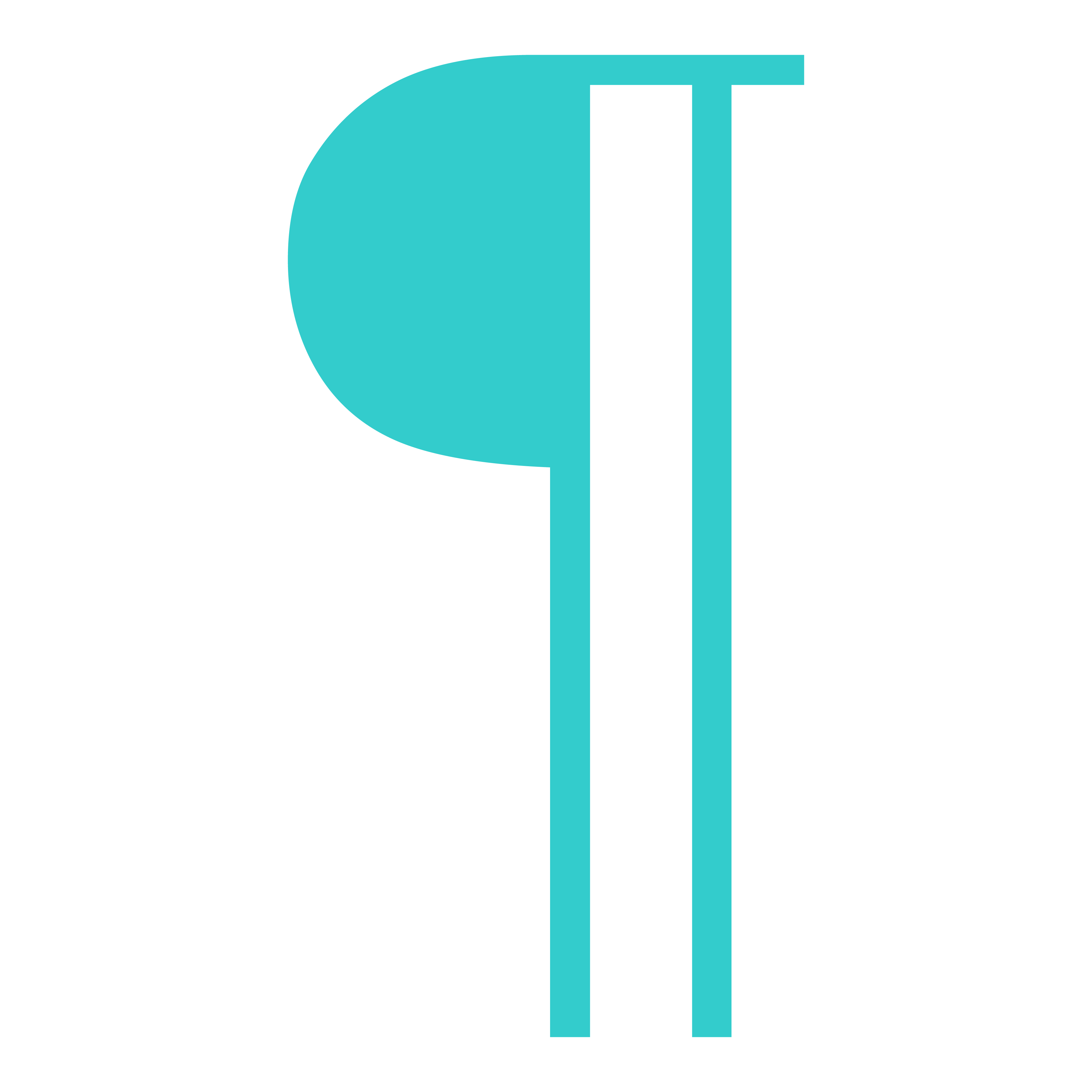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100m 밖에서 고양이의 사체를 치우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꼼짝않고 그 길에 서 있었다. 전봇대 아래에 누워있는 고양이의 꼬리를 보았다. 함께 걸으면서도 나는 앞을 보고 걸었는지 옆을 보고 걸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바닥을 보고 걷지는 않았다. 그가 보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미 전봇대에 깨진 머리와 튀어나온 눈알은 가려지고 겨우 축 늘어진 엉덩이와 꼬리가 빳빳하게 바닥에 붙어있는 모습만 보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참 교활하다고 생각했다. 그냥 모른채 지나가려는데... 그는 기어코 걸음을 떼지 못하더니 봉지에 담아서 길 가로 치워두기라도 하겠다면서 카페로 봉지를 얻으러갔다. 나는 버스 정류장까지 계속 걸었다. 멀찍이 서서 그가 손을 움직여 죽은 고양이를 봉지 속에 담는 것을 보았다. 내가 들지는 않았지만 작지않았던 그 고양이의 무게를 짐작해보았다. 우리집 고양이보다 조금 가벼운, 그 정도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말했다.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꽤 무거웠다고. 딱딱해 지는구나... 죽으면 딱딱해진다고 누가 그랬다. 나는 가까이에서 죽은 사람, 죽은 동물을 만져본 적이 없다. 갑자기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때 유행처럼 햄스터를 키웠었다. 우리집에도 동생과 내가 겨우 졸라서 산 두마리의 햄스터가 있었다. 귀여워 하다가 결국 한마리가 죽게 되었는데 도저히 내가 처리할 자신이 없어서 도와주겠다는 친구가 올 때까지 하룻밤을 그대로 두었다. 그 통안에는 나머지 한마리의 햄스터가 있었는데... 다음날 죽은 햄스터를 치우는 친구가 담담히 얘기했다. " 얘 눈알이 없어. 다른 한마리가 먹었나봐. 으 징그럽다" 충격이었다. 깔끔하고 깨끗한 죽음만 생각했나보다. 사고로 죽은 고양이를 똑바로 보지 못한 것도 나의 두려움이 한 짓이다. 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내가 만약 그 죽은 고양이의 감지 못한 눈을 보았다면.... 나 대신 해달라고 부탁해서라도 그 고양이를 옆으로 살짝 비켜두고 신문지라도 덮어주었을지도 모르겠다. 눈을 감고 기도했다. 1초, 2초, 3초. 안녕, 편히 쉬어. 미안해.
'생활-글-쓰기 > 히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5년 12월 / 히요 (0) | 2015.12.08 |
|---|---|
| 다 적지 못한 글 / 히요 (0) | 2015.11.23 |
| 몸을 살피다 / 히요 (0) | 2015.11.07 |
| 2015년 10월 / 히요 (4) | 2015.10.26 |
| 바로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 히요 (2) | 201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