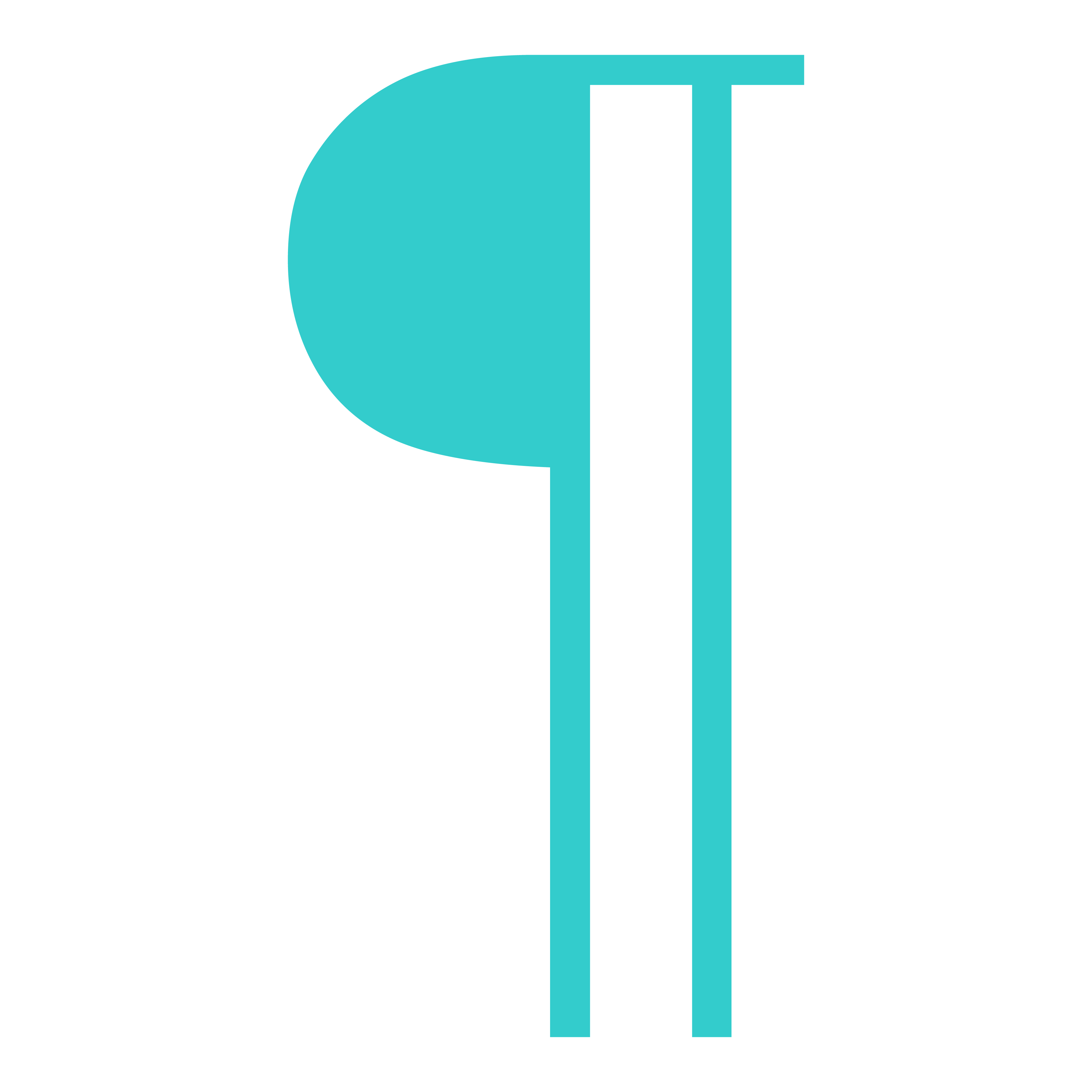장마철에는 간혹 비가 쏟아져내리는 것을 감당치 못한 하수도가 막히거나 넘쳐, 늘 닫아두었던 맨홀 뚜껑을 열고서 작업하는 광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뚜껑 아래에 펼쳐지는 광경은 말 그대로 시궁창입니다. 어린 시절에 구멍이 많은 하수도 뚜껑 위를 지나다 발이 빠져 본 적은 있지만, 온 몸이 그 아래에 빠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생활', 혹은 ‘현실'이라는 단어의 짝으로 ‘시궁창'을 떠올립니다. 특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흐르는 곳이며, 돋보이게 배치하거나 정돈할 수 조차 없는 수 많은 일들이 흘러드는 장소, 굳이 끄집어내어 깃발처럼 세워 흔들 이유가 없는 동시에 그 곳에 아무것도 없는 체 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침잠하여 생활의 수면에서 내내 머무르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은 어떤 장소.
화요일 모임 자리를 향하는 용두산 공원의 오르막 한 가운데에서 ‘그냥 집으로 갈까,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손에는 예상보다 무거운 작업물의 출력본이 들려있었고, 그 짐과 짐에 대한 생각이 양손과 마음을 가득 채웠기에, 다른 무언가를 더 담아낼 빈 자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팔 다리가 억센 ‘생활’이 발목을 주욱 끌어당깁니다. 그래도 절반이나 왔는데, 어차피 돌아가려고해도 절반가는 거 그냥 더 가보자, 하며 걸었더니 어느새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잠시 벤치에 짐들을 놓고 땀을 식히고, 바다 너머로 보이는 점과 같은 빛들을 보고 있다보니, 아주 거대하던 배들조차 멀리 떠나면 점으로, 조금 지나면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 되더군요. 그 장면이 이상한 용기를 주어 모임 자리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2주에 한 번, 자신이 발 붙이고 있었던 생활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저마다 어느 정도의 높이로 기어올랐던 순간을 나누는 자리. 내가 기어오른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르다 미끄러져 흉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더라도, 정말 우스운 모양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더라도, 그 지점에서 바라봤던 ‘생활'이라는 바닥을 나누는 데에 부끄러움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생활의 한가운데에 그저 ‘빠져있던’ 순간에는 누군가의 구조를 기다리고만 있는 ‘조난자'에 불과하겠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손을 내뻗어 기어올라본 사람이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시 기어오르며 자기 자신과 생활 사이의 거리 두기를 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벽을 오르는 데에 탁월한 등반가가 될 수도, 기어오른 곳에서의 장면을 절묘하게 담아내는 사진가가 될 수도, 그 외의 더 다양한 역할들도 가져볼 수 있겠죠. 히요의 글 덕에 참 다양한 체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생활을 잘 돌보는 사람의 체력은 그렇게 키워진 거리 두기의 근력에서 오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어 정리한 이야기 역시, 나의 흔적일 뿐 ‘나'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요. 조금 무책임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주 모임을 시작할 무렵, 은순쌤이 함께 자리하지 못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아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임에도, 부재한 이를 상기시켜 주던 녹음이 사라지고나니 되려 부재의 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전까지 쭉- 기다리는 상태로 머물게 될 대화, 이후에 듣게 될 누군가를 상정하여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곳에 있는 이들만을 고려한 대화가 가지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 우주로 보내는, 수신인 미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어떤 때에는 필요한 일이지만, 당장 바로 눈 앞의 사람들과 함께 발화되는 순간 휘발되는 메시지를 목격하는 것도 ‘아, 말이란 원래 이런 것이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시궁창의 바닥 깊은 곳에서 막연히 누군가의 답신을 기다리고 기원을 한다해도 옛 이야기들에서나 간혹 등장하는 (허공에서 동앗줄을 보내줌으로써 모든 갈등을 풀어줄) 기계적인 신(deus ex machina) 같은 것이 등장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교? 종교는 삶의 태도이자 신념에 가까운 것이지 기복의 대상이 되는 우상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념이나 태도에는 끈을 내려주거나 붙들어줄 팔다리가 없지요. 결국, 생활에서 스스로를 구원 해 줄 '신'은 없지 싶습니다. 하지만 구해줄 신이 없다고해서 무력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눈 앞에 보이는 주변의 것들을 붙들고 기어오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기어오르다보면 나름의 길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보면 꽤 높은 장소까지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활의 바닥이 나에게 멀어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바라보는 생활의 바닥 역시 멀찍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딘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 ‘너머'로. 까맣게, 점이 될 때까지.
+
아, 그리고 한 가지 일화를 붙입니다. 얼마전 작은 가게에 앉아있었는데, 그 곳에서 돌보는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제 무릎 옆에 기대더니, 내내 낮잠을 잤습니다. 그 날의 대화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때에 고양이도 잠에서 깨었고, 각자 처음의 모습처럼 따로 떨어진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다리 한 켠이 왠지 서늘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고양이가 제게 기대어 있는 동안, 그 지점이 평소보다 따뜻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거겠지요. 저 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등 한 쪽이 서늘해진 것을 느꼈을 겁니다. 갑자기 그 순간, 제가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주 연화씨의 ‘온기'에 대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덧붙여, ‘온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주고 받았던 화요일의 온도도요.
2015.11.10, 생활-글-쓰기 모임 2기 3회 후기
YKSQZME(익스큐즈미)
잡종.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밥.’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 밥을 여기저기 퍼나르는 방법은? 미디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디어를 더불어 공부했다. 밥을 실어나를만한, 마음에 쏙 드는 미디어를 찾아 헤매다보니 기획자와 교육자와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잇는 사각형 안팎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편식 및 리셋 증후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Excuse me하며 사과할 일이 많다.
'생활-글-쓰기 > 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후기] 운명을 거슬러 / 장현 (0) | 2015.11.26 |
|---|---|
| [후기] 코의 복수 / YKS (0) | 2015.11.25 |
| [후기] 대피소 : 떠나온 이들의 주소지 / 릴 (0) | 2015.11.13 |
| [후기] 일단은 내 식대로 이해하기 / YKS (0) | 2015.10.29 |
| [후기] 행복도 불행도 아닌 다행 / YKS (2) | 201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