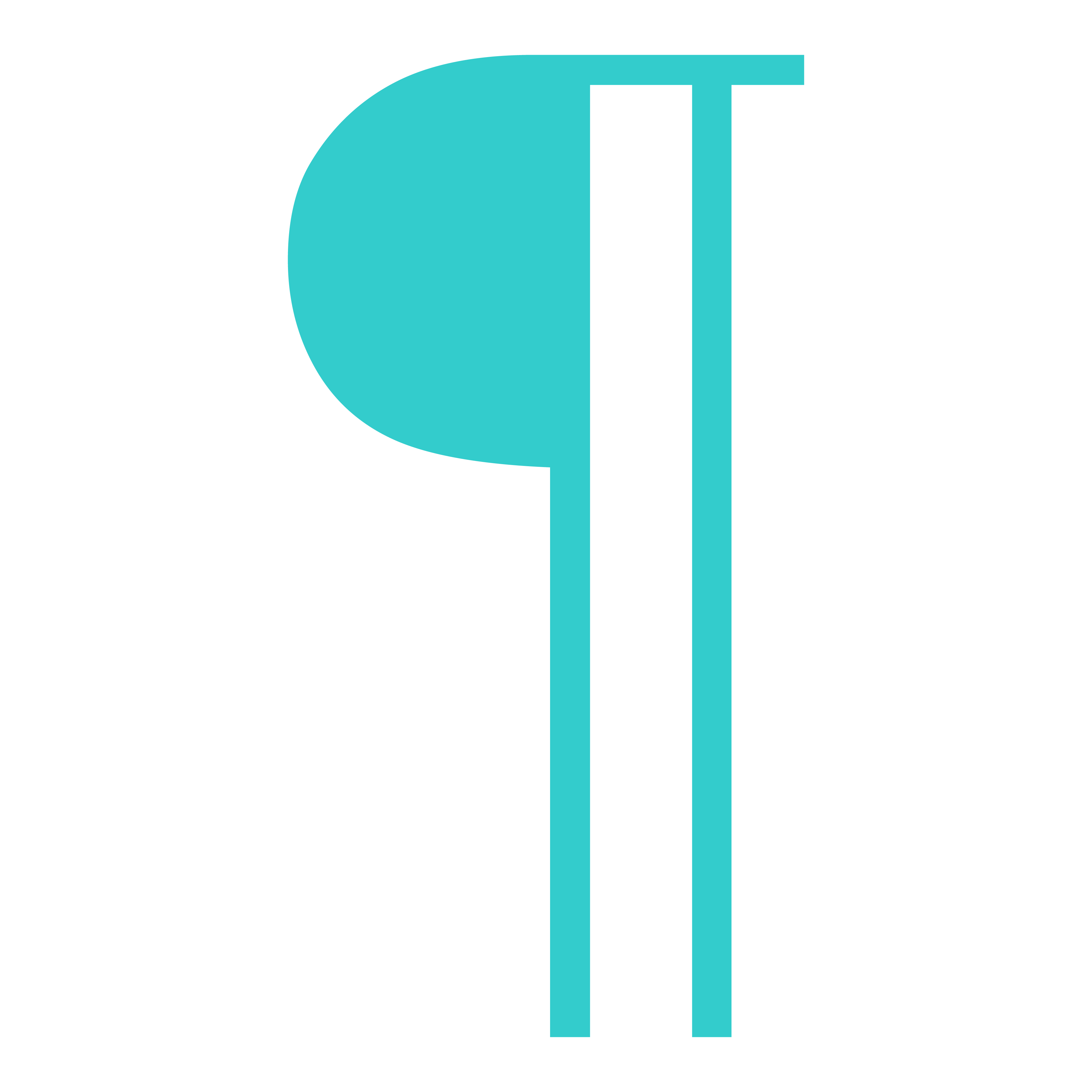코의 복수였다. 자신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쥐똥만큼이면서 마치 자기 얘기가 전부인양 스포츠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제목을 정한 내 글에 대해 복수한 것이 분명하다. 얼굴에서 보이는 툭 나온 부분, 그리고 안 쪽으로 푹 파인 구멍 두개가 코의 전부가 아니었다. 모임에 참석한 시간 내내 코부터 시작해서, 눈과 눈 사이, 이마의 뒤편에 텅 빈, 그러니까 뇌가 있다고 배웠던 지점마저도 코가 아닐까. 아니, 어쩌면 그냥 내 몸 전체가 코가 아닐까, 의심해보았다. 나는 거대한 코가 되었고, 그렇게 나의 코는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
안타깝게도 코에는 내보내는 구멍은 있을지언정 듣는 구멍은 없다. 물 속에 얼굴을 푹 담그면 아른아른하게 들리는 물 밖의 소리 같은 대화를 나는 잘 듣고 싶었지만, 코가 외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다. 2주만의 시간이라고, 2년만에 만나는 얼굴도 있다고 설득하며 완력으로라도 코의 목소리를 멈추고 싶었지만 코에는 막을 입도 없다.
코 속, 아니 어쩌면 몸 속에 가득찬 채로 평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콧물이 오늘처럼 자기 주장을 해대는 날에는 팽하고 풀어줘야한다. 게다가 코 스스로는 못하니 집게 손가락과 엄지로, 혹은 양 손바닥을 마주하게하고 손끝으로 코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어떤 깊숙한 이야기는 혼자서 꺼낼 수조차 없는 날이 있다. 이야기가 쏟아지는데, 저 혼자서 쏟기고 있는 이야기는 옆에서 보기가 좀 그렇다, 코로부터 자유롭게 낙하하고야 마는 콧물처럼.
전역을 앞 둔 친구가 부산에 왔는데, 모임 전까지 나는, 군대 이야기를 한 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약 2년 전 쯤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스무살의 앳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가 버리고 거친 목소리가 들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친구야 다른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 목소리가 변한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콧물처럼 몸 안에 늘 담고만 다니는 것들 중 하나다. 누군가 물어보아도 ‘글쎄요’ 정도로만 답할 수 없는 이야기. 혹은 다 식은 숭늉을 들이키듯 뻔한 시나리오로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정말 행복해보였던 애가 왜 갑자기? 라는 의문을 풀어줄 수는 없는 이야기. 그냥,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모임을 돌이키다보니 ‘어, 그게 아니었나보다’. 싶다. 어쩌면 나는 이야기가 뻔해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뻔하게 들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애매하게 코가 풀리면, 덜 시원하면, 답답해 할 사람은 나일 테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풀어 줄 자신이, 잘 들어줄 자신이 없었던 가보다. 여는 말의 끝에서 대성선생님이 던지셨던 ‘비참한 이야기를 듣는 다양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모임에 도착한 글은 생의 시작과 동시에 조금씩 고장나고 있고 삐걱대고 있는 삶을 담은 글들이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면장갑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삐걱거림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 온갖 소리가 나는 글들을 나는 잘 읽고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좋은 독자가 되자며 시작했던 모임의 첫 시작, 나는 지금 뻔한 독자인 채로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 반성해본다. 이번주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읽은 글들 역시도 낄낄거리며 입가만 닦고서 버리는 휴지조각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코를 풀어야했다. 잘 풀어야했다. 연화씨의 글에서 등장한 수 많은 손길들에 대한 기억도 꼼꼼히 잘 풀어야했고, 은순쌤의 삐걱대는 창과 어둠에 대해서는 코가 트지 않게 물티슈로 풀어야했다. 자리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장현씨는 글을 함께 읽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의 이야기도, 팽 시원히 풀어주고 싶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코를 풀기 전까지 스쳐갔던 많은 손길들을 기억한다. 아주 어릴 때는 코를 푸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할머니, 그리고 엄마, 때때로 낯선 어른들과 선생님들. 어느 하나 시원하지 않았지만, 그 손들을 떠나며 내 손이 코를 풀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배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시원하게 듣는 데까지는 욕심을 내지 않기로 한다. 아마 이 모든 모임도 끝나고, 또 어떤 시간 동안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코를 풀어줘야하는 순간들이 오겠지. 그러다보면 자기가 시원히 코를 풀 수 있는 순간이 오겠지. 오그라드는 마음 없이, 어제의 이야기를 지우는 일 없이. 그 전까지 다양한 손 중 하나가 되어보자. 되도록 시원은 하면 좋겠다만 시원함과는 달리 기억에 남는 손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비유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후기를 다 쓰고서야 했다. 나는 오늘도 코의 복수에 시달리고 있다. 가진 것이 콧물 밖에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라 결국은 콧물로 후기를 쓰고야 말았다.
2015.11.24, 생활-글-쓰기 모임 2기 4회 후기
YKSQZME(익스큐즈미)
잡종.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밥.’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 밥을 여기저기 퍼나르는 방법은? 미디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디어를 더불어 공부했다. 밥을 실어나를만한, 마음에 쏙 드는 미디어를 찾아 헤매다보니 기획자와 교육자와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잇는 사각형 안팎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편식 및 리셋 증후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Excuse me하며 사과할 일이 많다.
'생활-글-쓰기 > 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후기] 그릇 / YKS (2) | 2016.01.10 |
|---|---|
| [후기] 운명을 거슬러 / 장현 (0) | 2015.11.26 |
| [후기] 까맣게, 점이 될 때까지 / YKS (0) | 2015.11.16 |
| [후기] 대피소 : 떠나온 이들의 주소지 / 릴 (0) | 2015.11.13 |
| [후기] 일단은 내 식대로 이해하기 / YKS (0) | 201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