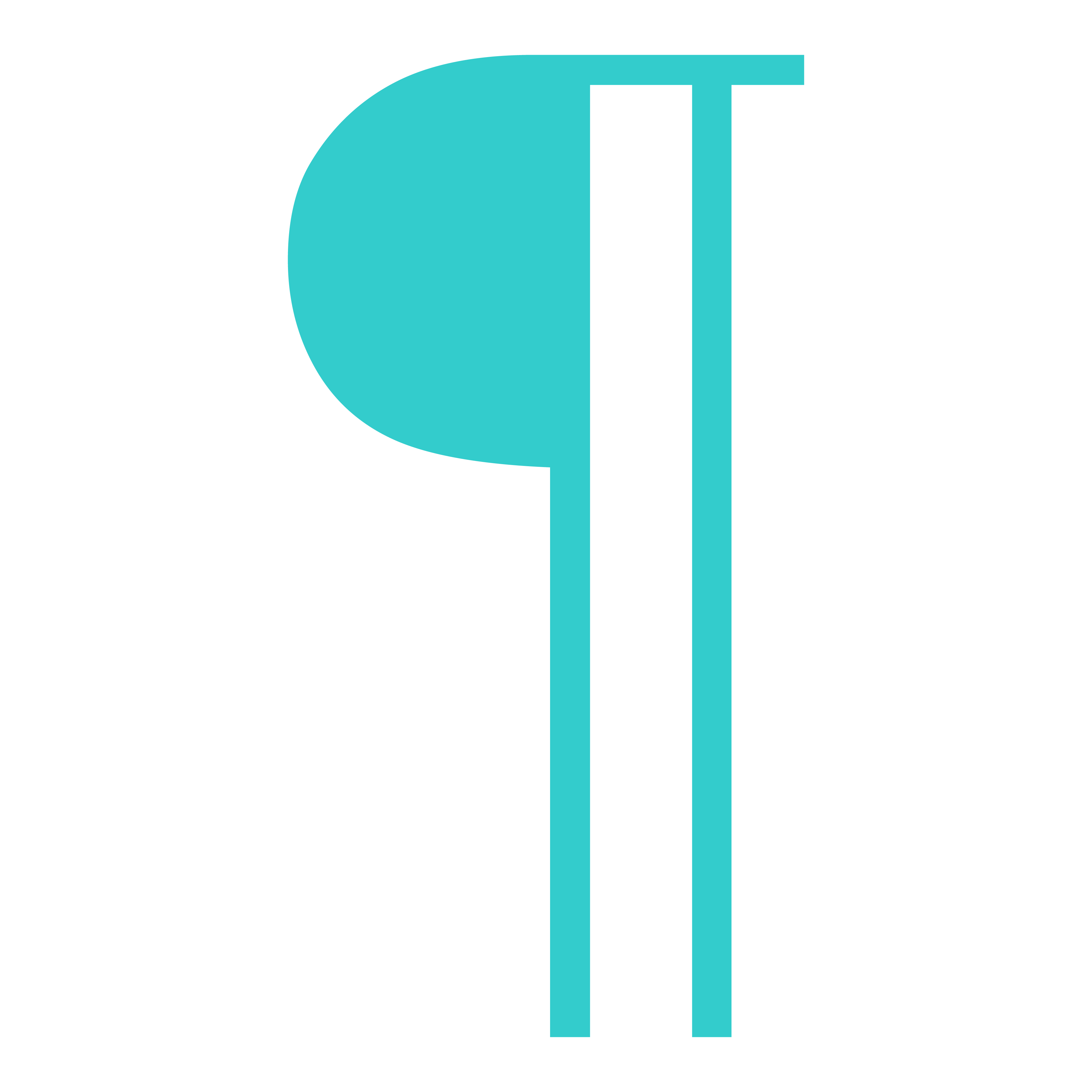나는 모은다. 뻔하기만 한 매일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이 동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급하게나마 주머니에다 쪽글들을 모으고, 아침이 왔다는 사실도 잊게 만들 정도였던 어제의 꿈들을 되새기고, 그 곳에 다시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소리를 모으고, 누군가가 버리고 간 승차권을 줍고, 그러다 다시 누군가가 남긴 글을 손으로 다시 한 번 옮기면서 이 ‘이야기들'을 무엇에 담아야 가장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야기들은 모든 곳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것은 글에 담으면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또 무언가는 그림으로 담지 않으면 흘러넘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몸짓으로 담아내어야, 또 어떤 때는 낯선 나라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어우러지는 것도 있다. 보통 생활-글-쓰기 모임에는 언제나 ‘이것은 글에 넣어야 어울릴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집어넣어 오곤 했는데, 지금까지의 모임과 준비했던 글들을 되돌아보니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글자 밖으로 의미가 넘치기도 하고 글자에 비해 의미가 모자란 때가 더 많았음을 기억한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릇이 하나만 있으면 곤란하지만, 두 개, 세 개가 있을 때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곳으로 넘쳐 흐르기도 하고, 부족한 이야기들에 더해지기도 했으니까. 원래는 준비해오지 않았지만, 만나야만 생겨나는 이야기가 있었고, 새로운 얼굴이 있을 때에만 나눌 수 있는 의미들이 있었으며 또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예감할 때에만 준비할 수 있던 글도 있었다. 어떤 변화가 더해지건, 이야기는 꼭 필요한 만큼 더해지고, 또 넘친만큼 스며들었다.
새해의 다섯번째 날에 모였던 이들 가운데에 놓여있던 뱅쇼를, 작은 잔으로 나누어마시는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지는 내내, ‘나'라는 그릇에 닮긴 삶을 ‘글'이라는 그릇에 옮겨 담아 한 모금 한 모금 나누었던 가을과 겨울의 시간을 떠올렸다. 여름의 시간 동안 가졌던 모임과는 달리,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감각, 그리고 새로운 해를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이리로 저리로 분주하게 오고갔다. 모두의 글과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도 있는, 고유의 힘이 있었다. 그 힘이 가진 방향으로 우리 모두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대피소'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실제 대피소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그 곳은 바깥의 위험을 피해 들어가는 장소라는 것은 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의 대피소도 있겠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붙들고 있을 때에만 가 닿을 수 있는 정신의 대피소도 있다. 두 대피소 모두, 짧건 길건 시간을 보내며 바깥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혹은 스스로가 그 위험을 감내할 자신이 있을 때에 문을 열고 걸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어 ‘베이스캠프'로 부르기 시작하면, 그 장소는 지도와 나침반을 얻어 알려지지 않은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시작점이 되기도 할 것이고, 또한 낯선 곳을 탐험한 후의 경험을 되새길 수 있는 저장고가 될 것이다. 그 때는, 바깥의 안전함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확신과는 무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될 것이다.
나는 지난 여름의 모임을 대피소로 여기고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들곤 했던 것을 기억한다. 가을이 되어 다시금 시작된 모임의 자리는 조금 더 경쾌했다. 한동안 그 낯선 감각이 무엇인가 곰곰스레 생각해보았는데, 이제야 그것이 '경쾌함'임을 알았다. 그것에 적합한 이름을 나 스스로는 무엇으로 붙여둘까, 하다가 떠올린 것이 베이스캠프라는 이름이다. 분명히, ‘생활'도, ‘글'도, ‘쓰기'도, ‘모임'도 내가 완벽히 해내고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 장소에 이르러 글을 쓰거나 나눌 때마다 이상한 힘을 얻었다. 어쩌면 그것이 뿌연 지도와 나침반을 닮아있다는 생각도 한다. 따끈한 불을 가운데 놓고 달그락 거리는 잔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얻은 어떤 격려를 바로 앞에 놓인 그릇에 잘 담았다.
낯선 것들과 마주하고,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보통 ‘깨진다' 라고 표현한다. 예전에는 많이 깨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었지만, 어느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나면 대체 나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게 뭐람? 하는 생각에, 많이 깨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깨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깨진 채로 두면 위험한 곳도 있다. 가끔은 흩어진 조각은 좀 털어내고, 거칠거나 날선 모서리는 줄로 갈아줄 시간도 필요하다. 모임의 두번째 기수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깨어졌음을 되새겼다. 어떤 것들이 조각인지 남아있는 것인지 분간하고, 거친 것들은 좀 더 다듬어내야지. 또 다른 모양의 그릇이 되어서 삶을 담기까지, 또 차마 다 담지 못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때까지.
2016.1.5, 생활-글-쓰기 모임 2기 7회 후기
YKSQZME(익스큐즈미)
잡종.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밥.’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 밥을 여기저기 퍼나르는 방법은? 미디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디어를 더불어 공부했다. 밥을 실어나를만한, 마음에 쏙 드는 미디어를 찾아 헤매다보니 기획자와 교육자와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잇는 사각형 안팎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편식 및 리셋 증후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Excuse me하며 사과할 일이 많다.
'생활-글-쓰기 > 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후기] 운명을 거슬러 / 장현 (0) | 2015.11.26 |
|---|---|
| [후기] 코의 복수 / YKS (0) | 2015.11.25 |
| [후기] 까맣게, 점이 될 때까지 / YKS (0) | 2015.11.16 |
| [후기] 대피소 : 떠나온 이들의 주소지 / 릴 (0) | 2015.11.13 |
| [후기] 일단은 내 식대로 이해하기 / YKS (0) | 201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