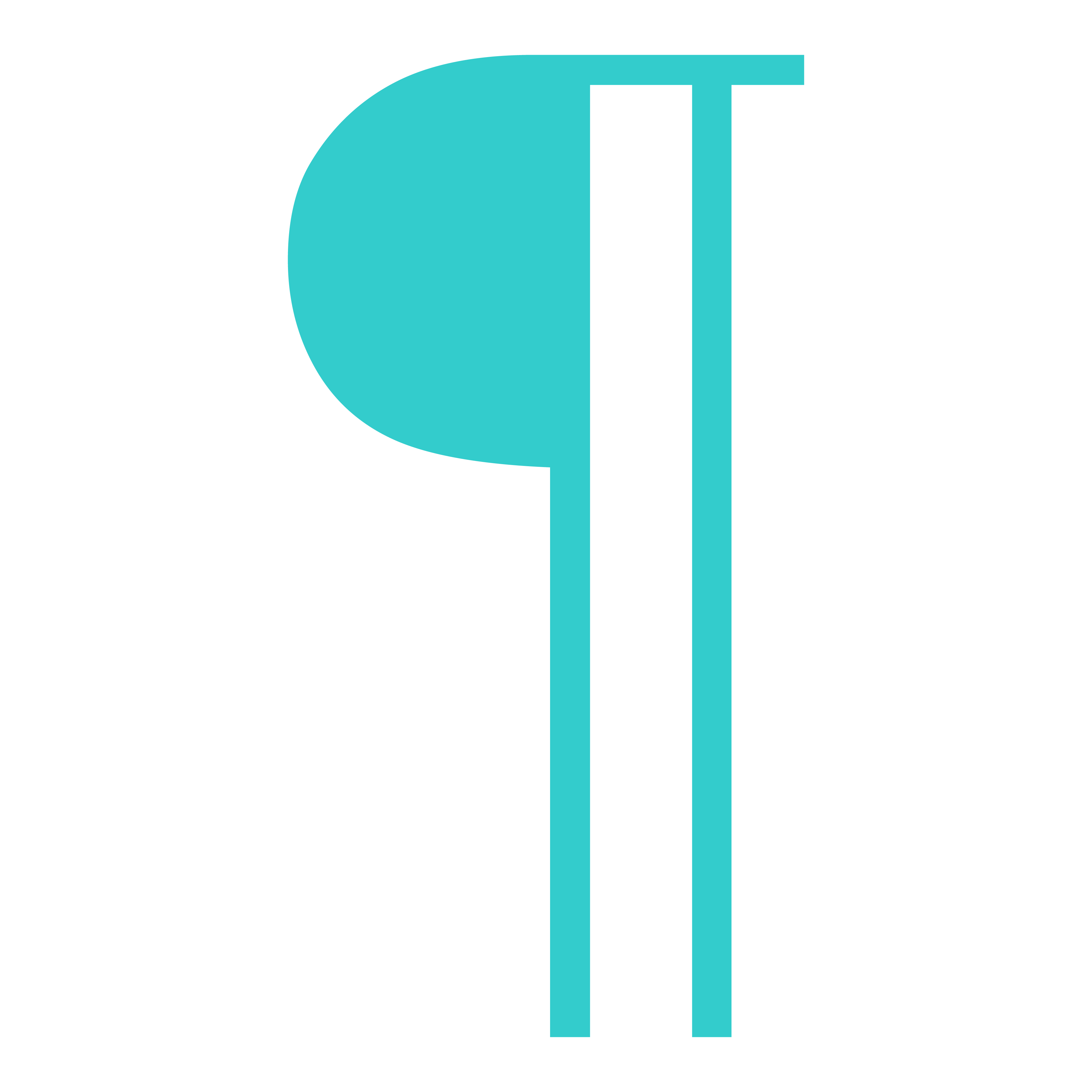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연등이라고 해서 취침시간 넘어 까지 TV를 보게 해줬습니다. 그 시간에는 보통 영화를 보는 게 관습처럼 굳어져있었죠. 그리고 장병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무슨 장르의 영화를 볼지 말이죠. 보통은 액션이나 스릴러를 추천하는데, 가끔 누가 명령이라도 내린 듯 로맨스를 선택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땐 다들 어쩔 수 없이 로맨스 영화를 보죠. 왜 어쩔 수 없냐면, 로맨스 영화는 결국 장병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 취침을 하려 누우면, 아니나 다를까, 어디선가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시작부터 재미없게 군대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네요. 하지만 이 소설, 『슬픈 짐승』을 설명하기 위해선 그 ‘한숨 소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으로 읽었던 장소도 그 한숨 소리 가득했던 군대 안이었으니까요. (물론 읽을 당시의 저는 함부로 한숨도 쉬면 안 되는 일병이었습니다.) 당시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저는 얼마 읽지도 않았는데 사라져버린 시간에 깜짝 놀랐었죠. 190여쪽 밖에 되지 않는 책을 읽는데 왜 이리 오랜 시간이 걸리나 하구요. 그건 아마 문장의 밀도 때문이었겠지만 그래도 분량에 비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계속 붙잡아 뒀던 페이지들의 무게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을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역시나 ‘한숨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슬픈 짐승』의 주인공 ‘나’는 서독과 동독이 통일 된 후 베를린 자연사박물관에서 운명의 연인 ‘프란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 필요한 단어는 오직 “아름다운 동물이군요.”(21쪽) 뿐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듯 사랑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짧은 한마디에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주인공은 옛날에 발작을 일으킨 뒤 얻은 대답인 ‘인생에서 놓쳐서 아쉬운 것은 사랑밖에 없다’를 ‘프란츠’에게 열렬히 실현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물음과 대답을 하게 되고요. 어쩌면 이 소설은 그런 물음과 대답이 전부인 소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랑이 스스로를 끝없이 돌아보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면 모든 사랑이야기는 결국 물음과 대답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를테면 “프란츠는 나를 볼 때 무엇을 보는 것일까.”(46쪽) 같은 물음은 사랑의 관계성 같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결국 혼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하는 것인지 말이죠. 대성 선생님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마음까진 결국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이런 사랑이야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던 거 같네요. 아마 작가 또한 이를 알았기에 철저한 1인칭으로 『슬픈 짐승』을 썼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결론은 너무 슬픕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건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주인공은 사랑을 믿음의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이라고 말하죠.
아테는 사랑이 아마 믿음의 문제, 일종의 종교적 광기일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자연이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 전체는 그저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카 마론, 『슬픈 짐승』, 문학동네, 2010, 144쪽
주인공의 말대로라면 더 이상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나거나 진부하게 끝나거나 둘 중 하나”(123쪽)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일 필요가 없듯이 사랑도 어떤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한 단어가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프란츠’의 태도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자꾸 보이는 주인공에게 프란츠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그녀를 멀리하게 되죠. 어쩌다 그녀를 만나게 될 때도 말로 잘 달래려(혹은 길들이려)합니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죠.
그가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이야기를 했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사랑의 죄인들을 위한 지옥을 통과해 데려갈 때 피올로와 프란체스카의 고통 때문에 단테는 정신을 잃는다. 그들은 영겁의 세월을 거친 돌풍에 쫓기고 부딪히며 지옥을 통해 날아다녀야 하지. 프란츠가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놓아주지 않아. 지옥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아. 아버지가 루치에 빙클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 이야기를 내게 했었어.
짐승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 내가 말했다.
-171쪽
소설의 끝에 가서 그녀는 얼핏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 보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온몸을 던지는 하나의 ‘짐승’이 되는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프란츠’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죽는 것”(187쪽)은 어쩌면 짐승들의 언어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뉴스로 보도됐다면, ‘내연녀, 질투에 내연남 죽여’라는 한 문장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다른 말로 이 이야기는 누구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밤에 들렸던 ‘한숨 소리’를 기억합니다. 강렬한 사랑이야기를 보고 난 뒤 우리들이 냈던 소리는, 언어로 말해진 소리도 아니고, 목에서 울렸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그 심한 규율과 억압을 뚫고나온, 어떤 ‘공룡성’의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아주 가끔 기억합니다. 점점 더 많은 짐승들이 오는 와중에 조용히 다른 짐승들 사이에 누워있던 그때의 모습을요. “나는 그들 한가운데 누워 있고 그들이 무섭지 않”(195쪽)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워있습니다.
‘15.12.06
박세진
어린 시절 벽에 걸린 별과 산을 봤다. 언제고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다.
'세 계절 읽기 모임 > 두드림의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표정하고 단단하며 황량한 얼굴을 한 무명의 삶 / 릴 (0) | 2015.12.17 |
|---|---|
| 하얀 화면이 켜진 분명한 다음 순간 / 박세진 (0) | 2015.12.17 |
| 누구의 것도 아닌 어떤 기억에 관한 이야기 / YKS (0) | 2015.11.26 |
| 적어도 춥지 않은 무엇 / 박세진 (1) | 2015.11.24 |
| 애도로서의 일기 쓰기 / YKS (1) | 2015.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