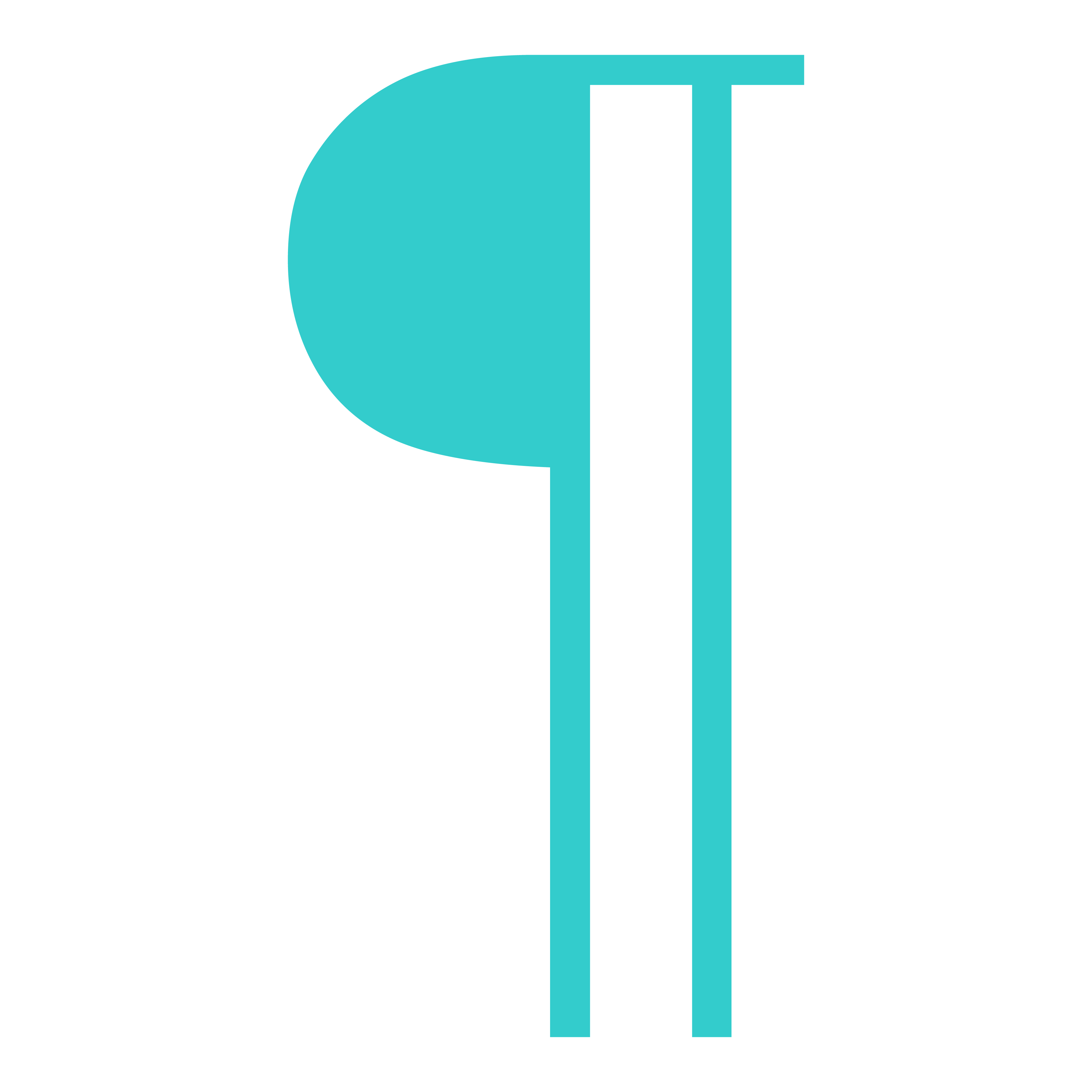바람이 눈을 뽑아가버릴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고 외출했었다. 몇 겹 씩 덧 입은 옷들 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몸을 감싼 거죽 안쪽까지 스며들어서 먼지를 털어내듯 할 수 없었다. 15년만의 한파라고들 했다. 어제였다. 꽁꽁 여민다고해서 결코 녹일 수 없는, 깊은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는 도리어 옷을 벗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목욕탕에 가야지, 하며 간단한 짐을 챙긴다.
대중탕에 가는 것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일이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제한 후에야 입장할 수 있는 장소. 휴대전화는 당연히 두고 들어와야하고, 책도 신문도 들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 속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곳에 충만한 몸들에 집중하는 것 뿐이다. 구석구석 씻는 일은 개운하고 때때로 보람차기까지 하다. 그러나 나는 종종 온탕에 앉아 가만히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도 목욕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즐긴다. 가만히 앉아있다보면 누구 하나 같은 얼굴과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듯, 몸에 있어서도 꼭 같은 엉덩이를, 등을, 배를, 팔뚝을, 종아리와 허벅지를, 가슴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리고, 평소에는 듣기 쉽지 않은 낯선 이의 배꼽 같은 단어들이 종종 습기찬 공기에 실려 퍼지기도 하고 귀에 꽂히기도 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드러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모든 것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이들의 수다에는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된다.
목욕탕 밖의 세계에서 몸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갓 태어난 시기 이후부터 꾸준히 무언가를 걸치며 몸을 부재의 상태에 가깝도록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일종의 덕목처럼 여겨진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몸이 ‘부재'해야 할 장소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대부분 어떤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난 몸은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지만, 철저히 의도한대로 드러낸 몸은 격렬한 메시지를 담은 텍스트가 되거나 혹은 범죄가 된다. 토플리스 시위로 유명한 ‘FEMEN’은 몸을 저항의 무기로 사용한다. 목욕탕에서는 그 누구도 벌거벗음을 정치적 행동으로 바라보지 않지만, 세계 곳곳의 ‘페멘'들은 그들의 몸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차별을 반대하고, 대안을 탐색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목욕탕 안에서의 몸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신체의 어떤 부위만이 대상화되지 않으며 그 무엇도 상징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할 따름이다. 무심히 시선을 돌리다 한 중년 여성의 튀어나온 아랫배를 본다한들, 모델이 아닐까 싶을 만큼 긴 신장을 가진 젊은 여성의 매끈한 목덜미를 본다한들, 흰머리를 한 주먹에 쏙 들어올 것 같이 쪽진 할머니의 늘어진 젖가슴과 텅 비어버린 엉덩이가 눈에 들어온다한들, 그것은 어떠한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풍경이 되고,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역시 풍경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공평한 장면으로 완성된다.
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모종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신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이 장소는 내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직감은 필수적이다. 태생적으로 그 어떤 단단한 껍데기도 없는, 가죽조차 한없이 얇은 이 몸뚱어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놓을 수 있는 장소를, 이 도시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생각이나 지나간 경험들에 기대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나의 몸에 대한 이야기는 신뢰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쉽게 꺼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그런데, 목욕탕이라는 생면부지의 사람들로 가득한 이 공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있으며 나 자신의 벌거벗음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 채로 자연스레 받아들여진다.
어쩌면 나는 어떤 거창한 계획이나 행위의 의도, 혹은 존재의 이유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 없이도 나 자신이 머무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소에 이르고 싶은 때에, 그리고 모두가 그런 모습을 하고 앉아 기껏해야 때를 미는 데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 그것만이 가치 있는 어떤 활동이 되는 아주 단순한 장소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때에 목욕탕에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중탕은 점점 그 모습을 찾기 힘들어져간다. 나는 그 남은 흔적들인 굴뚝의 사진을 찍어 수집하고, 가만히 들여다보곤 한다.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다. 반가운 친구와 인사를 하는 것처럼 아주 가볍고, 일상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영업이 멈춰진 목욕탕 건물 위, 남아 있는 굴뚝들을 볼 때에, 어떤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역할과 가치도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잊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 정도는 한다. 새로운 스며듦의 장소에, 저런 세계의 면면이 깃들어있을 것이 분명하다. 오늘도 나는 그 모습과 온도를 머금고 있는 새로운 곳들은 대체 어디가 될지를 궁금해하며, 평소보다 더욱 뜨끈하게 느껴지는 온탕에 몸을 깊이 담근다.
2007, F2, 장전동 / YKS
YKSQZME(익스큐즈미)
잡종.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밥.’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 밥을 여기저기 퍼나르는 방법은? 미디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디어를 더불어 공부했다. 밥을 실어나를만한, 마음에 쏙 드는 미디어를 찾아 헤매다보니 기획자와 교육자와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잇는 사각형 안팎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편식 및 리셋 증후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Excuse me하며 사과할 일이 많다.
'생활-글-쓰기 > YK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얼굴 없는 이야기들 / YKS (1) | 2016.01.03 |
|---|---|
| 2015년의 리스트 / YKS (0) | 2015.12.22 |
| 다시, 삶의 재구성 / YKS (1) | 2015.12.20 |
| 안부가 부른 사고 / YKS (0) | 2015.12.17 |
| 뭉뚱그릴 수 없는 촘촘함을 향해 / YKS (0) | 2015.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