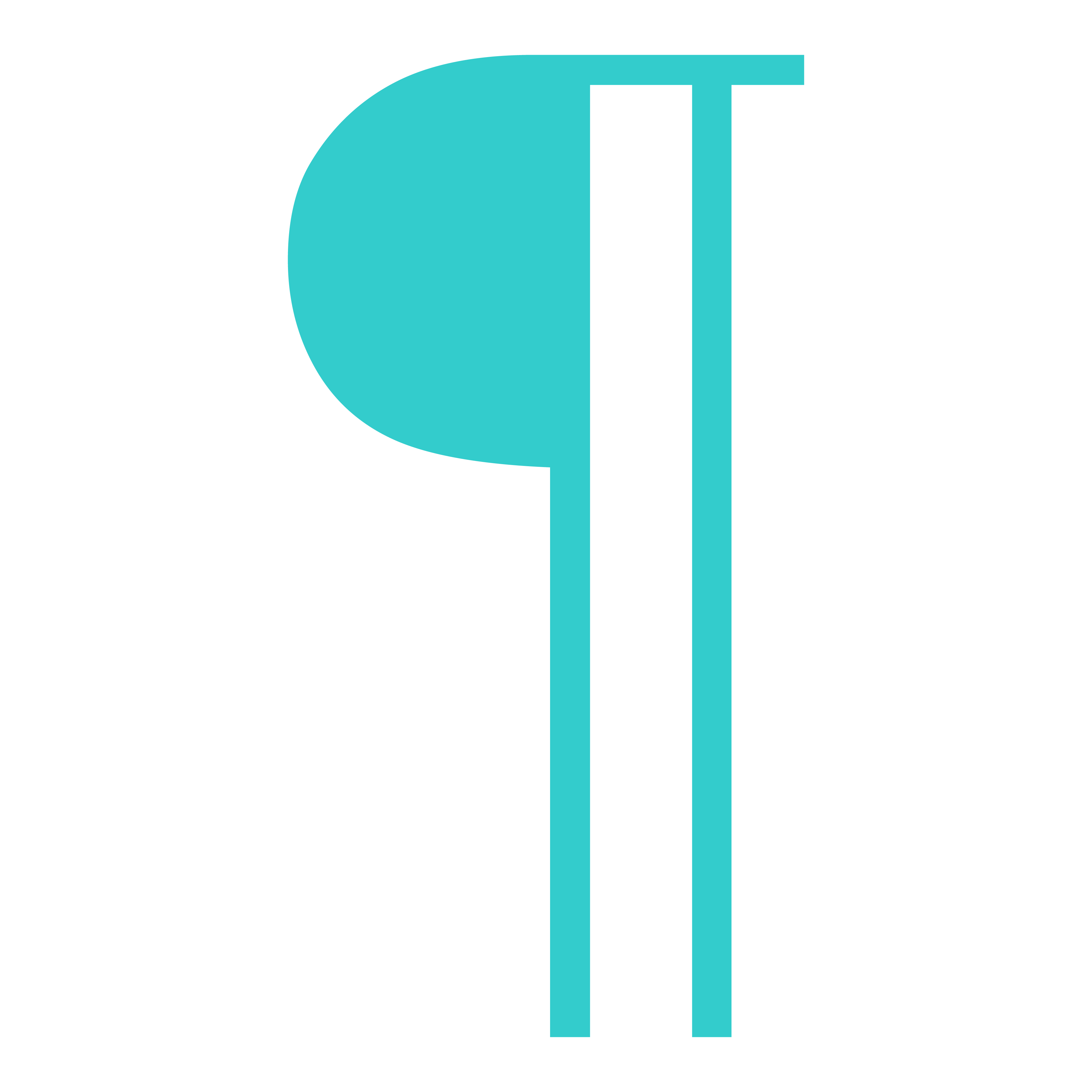세상이 있다. 그 앞에 ‘저기’라는 글자 하나를 놓아본다. 저기 세상이 있다. 언제나 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가로 길이 138센티미터 세로 길이 64.5센티미터의 네모난 박스. 그러니까 쭉 뻗어 앉은 두 다리, 발끝으로부터 1.5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 세상이 있다. 제법 크다싶은 화면이기에 적정한 거리 유지는 필수. 물론, 그럼에도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세상을 쏟아낸다. 굳이 나와 마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나를 압도하는 세상,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쇼파와 에어컨과 캣타워가 놓이고 시계와 달력이 벽에 걸리고 카펫이 깔리고, 그리고 두 사람의 몸뚱어리가 나란히 텔레비전을 마주하고 앉는다. 탁자는 일찌감치 거실 측면으로 밀려나 있다. 텔레비전과 두 몸뚱어리 사이에 놓여있던 탁자가 무용지물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이다. 각종 공과금 고지서와 은행입출금전표와 영수증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고 난데없는 고양이 물그릇이 떡하니 놓여있다.
저기에 세상이 있다. 한 번 열리면 좀처럼 닫히지 않는 세상이 있다.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닫히고 난 뒤의 적막함엔 어쩔 도리가 없어 그냥 열어두는 세상, 적막하다는 느낌 뒤에 오는 침묵, 특히나 나란히 앉은 몸뚱어리를 마주하고서도 서로 할 말이 없음의 상태를 깨닫게 될까 두려워 계속해서 열어두는 세상, 텔레비전.
대구에 집이 있다. 거주하는 곳은 아니지만 부산에도 머무는 곳이 있다. ‘집’하면 언뜻 떠오르는, ‘유지하고 지키고 가꾸어야 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되지만 왠지 내키지 않는다.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늘 머무는 부산의 <지생자> 역시 ‘유지하고 지키고 가꾸어야 할’ 곳인 것은 매한가지기 때문이다.
대구의 집과 부산을 한 번 오가는 시간은 약 세 시간. 현관문 앞에 쌓여 있는 재활용쓰레기, 싱크대 거름망의 음식물 쓰레기, 세탁기 안 수북한 빨랫감, 거실과 방 여기저기 뭉치고 날리는 고양이털, 발 디딜 때마다 버석거리는 모래와 풀썩거리는 먼지들, 베란다 곳곳에 죽어 있는 날벌레와 바퀴벌레, 거미줄, 잡다하게 어질러진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고 초기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과 그 노동도 만만치 않다.
4일과 3일씩 대구와 부산을 오가는 일은 매주 반복된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 어느 한 곳에 몸과 마음이 함께 오롯이 존재했던 적은 없다. 열어둔 창으로 갑작스레 쏟아지는 비가 들이치지는 않는지, 사람 없는 빈 집에 도둑은 들지 않는지, 먼지는 또 얼마나 많이 쌓일 것이며, 약을 놓았는데 바퀴벌레는 죽어 있을지, 방충망에 냥이들이 매달려 있다 떨어지진 않을지, 남편이 밥은 잘 챙겨 먹을지, 음식물 쓰레기는 제대로 수거해 갔는지, 이번 달에는 수도요금을 주인집에 줘야 하는데……. 내가 존재하고 머물지 않을 곳에 대한 걱정 역시 반복된다.
선생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만났던, <지생자> 일원이기도 한 마혜련으로부터 들은 질문이다. 이래저래 일이 많은 <지생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에서 하는 말일 것이다. 말을 건네며 짓는 표정으로 봐서는 ‘이러다 우리 폭망하는 거 아녜요?’라는 우려 역시 보이기는 했지만 확신이나 낙관적인 말을 건네지는 않았다.
그래, 혜련아, 많이 궁금하제? 나도 궁금하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 너무 궁금하다.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수 있을까. 연락도 없이 소원해진 사람들과는 어떻게 될까. 차라리 만나서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
'생활-글-쓰기 > 은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회) 나의 중심 / 최은순 (0) | 2015.12.07 |
|---|---|
| 숨어서 밖을 봐요 / 최은순 (0) | 2015.11.24 |
| 길에 누운 사람들 / 최은순 (4) | 201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