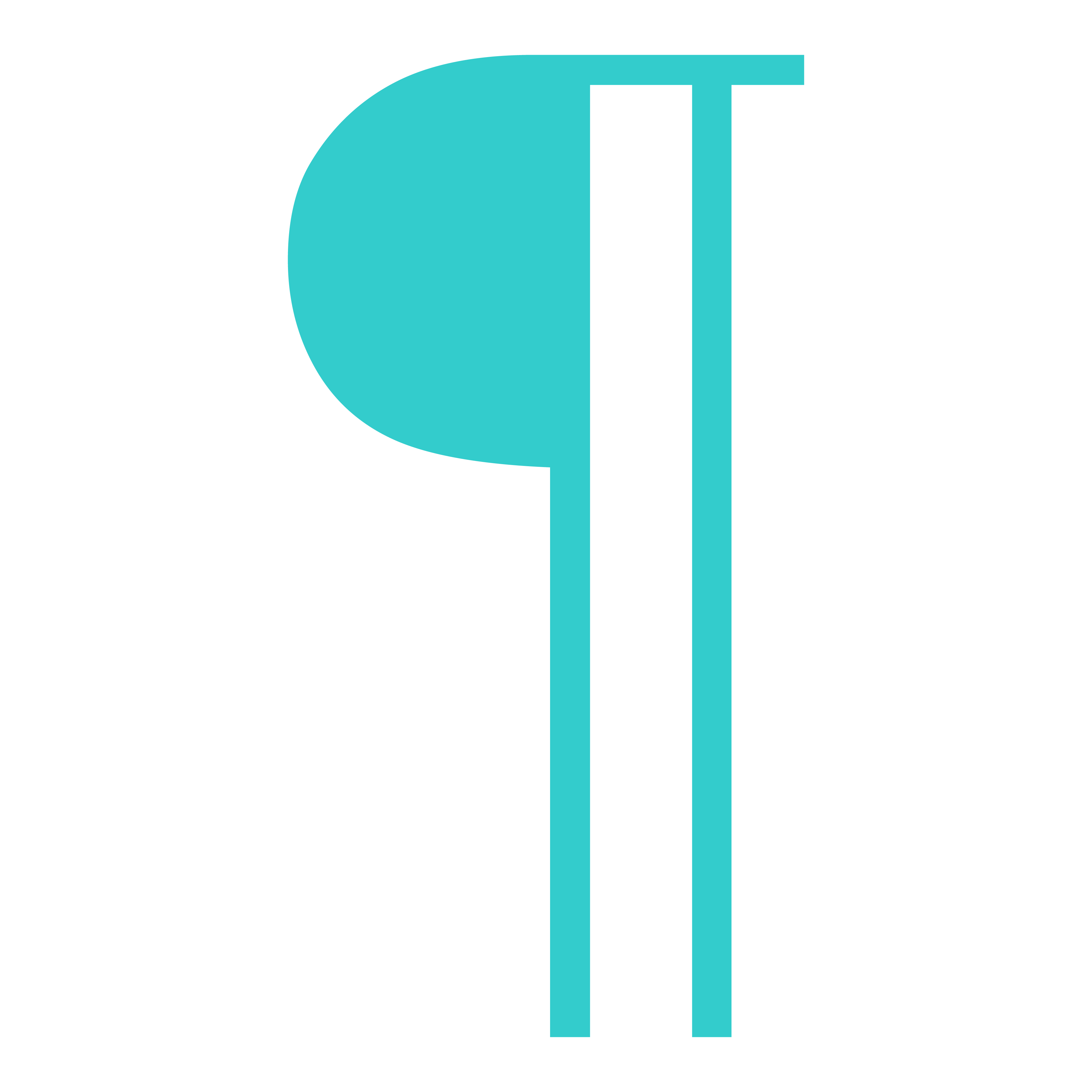2016. 4. 8
3월은 내내 여기저기를 걸어다녔다. 찾지 않고 쫓지 않으면서 봄에 ‘입회’할 수 있는 은밀하고 드문 순간을 기대하며 걷고 또 걸었다. 도시 바깥으로 걸었고, 내 생각의 바깥으로 나가고자 했으며, 의도와 욕심 없이 걷는 방법이 있기라도 하듯이 열심을 다해 걸었다. 한 선생님과 세 시간이 넘도록 천변을 걸으며 응/답하는 쾌락을 마음껏 누려서일까 발뒷꿈치 부분의 아릿함이 이 주가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다. 걷기 힘들정도의 통증은 아니지만 걸을 때마다 작은 신호를 보내는 듯한 그 통증 덕에 신발의 상태와 걷는 자세, 그리고 몸의 상태를 잠깐이나마 돌아보게 된다. 생활이란 것이 편재해 있는 ‘작은 신호들’의 기미를 파악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조합하여 할 수 있는 만큼의 ‘꼴’의 형상으로 만들어보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은 기미와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일. 곳곳에 편재해 있는 작은 신호들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일. 몸을 외부적인 것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로 잠시 내어주는 일. 글을 쓰는 일이, 비평을 하는 일이 꼭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텍스트(text)를 읽는 것이 글이라는 육체를 직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결(texture)을 분별하고 예민하게 반응해 그 현장으로 입회하는 일이기도 할테니 말이다.
오랜 친구와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곳에 올라 산 정상으로 이어져 있는 길을 따라 오랫동안 걸었다. 짊어지고 오래 걸을 수 있는 만큼만 가방에 담는 일. 고작 하룻밤 노숙하고 오는 일정이지만 좁은 가방 안에서 필수적인 것과 욕심이 환하게 나뉜다. 짐을 싸며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과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나누는 일의 연습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도리없이 알게 된다. 능선을 따라 하산하며 산 아래 마을들을 처연하게 바라보며 걸었다. 인가는 온데간데 없고 죄다 팬션들 뿐이다. 남한의 ‘모든 명당은 다 초소’라던 시구절이 기거할 곳이 이젠 어디에도 없을만큼 마을 사람은 없고 조악한 신식 건물들만 우뚝하다. 그 흔한 벚꽃나무 하나 없던 신불산의 능선을 내려오며 나는 오래전 산 어귀에 불 밝히고 어울려 살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무늬를 막연하게 그려보았다. 이 산의 능선 모양과 조금이나마 닮아 있을 거라 상상하며 수몰지구를 눈으로 천천히 매만지는 손길로 이 고장에 흐르고 있는 마음의 능선을 그려보았다. 상처입은 초식동물처럼 숨죽이고 걸었다. 산에도, 마을에도, 봄에도 입회하지 못했다.
'생활-글-쓰기 > 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다―이별례(8) / 릴 (2) | 2016.01.26 |
|---|---|
| 걸레의 자리 / 릴 (2) | 2016.01.16 |
| 10대라는 비평-쓰지 못한 글(1) / 릴 (3) | 2015.12.20 |
| 절판도서 / 릴 (0) | 2015.12.16 |
| 두드러기, 몸으로부터의 소식 / 릴 (0) | 2015.12.14 |